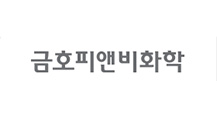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는 중국산이 무관세로 유입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PET 시장은 롯데케미칼, TK케미칼이 주도하고 있으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됨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중국산 PET가 무관세로 유입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PET 생산능력은 롯데케미칼 52만톤, TK케미칼 28만톤으로 양사가 80만톤에 달하고 SK케미칼, 휴비스 등을 포함하면 90만톤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롯데케미칼이 한-중 FTA 에서 수익성이 높은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수익비중이 낮은 PET의 관세 방어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PET 생산능력이 국내 최대이나 수익비중은 전체의 7.9%에 불과해 PE 26.4%, PP 19.3%에 크게 미치지 못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파악된다.
또 롯데케미칼 허수영 대표이사가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석유화학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PET 시황 악화에 따라 매출액이 2013년 1조2915억원, 2014년 1조491억원, 2015년 9321억원으로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2015년 100억원 이상 적자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PET병에 음료를 충전하는 보틀링(Bottling)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파키스탄 Lahore 소재 펩시콜라 보틀링기업 Lahore PepsiCo의 지분 51-52%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인수가격 등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칠성음료가 Lahore PepsiCo를 인수해 롯데알미늄의 PET 보틀(Bottle) 공급량을 확대함으로써 롯데케미칼의 PET칩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파키스탄에 앞서 필리핀과 미얀마 음료시장에 진출했으며, 특히 미얀마 현지 합작법인은 빠르게 성장해 2015년 3/4분기까지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50%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파키스탄 보틀링기업의 인수가 마무리되면 다른 아시아 보틀링기업을 추가 인수할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국내 PET 시장의 공급과잉을 완화하는 한편 한-중 FTA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산 PET 수입은 FTA 체결 후 2016년 5월까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PET 수입량은 2016년 1-5월 6669톤으로 2015년 1-5월 5588톤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중국은 PET 총 생산능력이 900만톤에 달하고 있으나 내수는 400만톤에 불과해 가동률을 낮춰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200만톤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PET 내수가격이 수출가격보다 톤당 100달러 수준 높아 PET 생산기업들이 내수판매에 집중하고 있어 공격적으로 수출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 PET 생산기업들이 마진이 높은 내수판매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PET 유입이 가속화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판도가 변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PET 수요는 2010년 22만-24만톤에서 2015년 30만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능력과 크게 차이가 나 공급과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장 관계자는 “국내 PET 생산기업들은 수출을 타겟으로 신증설을 감행했다”며 “중국의 PET 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해 수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비중은 음료용기 70%, 필름 및 포장용 플래스틱 30%로 음료수, 생수통 등의 PET병 비중이 절대적이나 최근에는 포장용 플래스틱 수요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PET 시장은 과일 등 포장용 플래스틱 등으로 수요가 다각화됨에 따라 연평균 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내수가 40만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PET는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성 플래스틱으로 수요가 다각화되고 있으나 무관세로 유입되는 중국산 PET는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