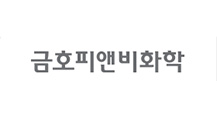일본은 에틸렌(Ethylene) 추가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틸렌은 미국에서 셰일가스(Shale Gas)를 베이스로 한 생산설비가 잇달아 건설되고 있으며 수입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CTO(Coal to Olefin) 프로젝트와 동시에 NCC(Naphtha Cracking Center) 정비에 나서고 있다.
중동 역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14년부터 NCC를 매년 1기씩 가동중지하고 총 12기 640만톤 체제로 정리했다.
2016년 봄까지 추진되는 NCC 재편은 당초 경제산업성이 명시한 에틸렌 생산량을 2020년 470만톤, 2030년에는 310만톤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최적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내수 및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추가적인 통폐합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에틸렌 시장은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며 거의 모든 생산설비가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 이과대학 대학원 킷카와 타케오 교수는 최근 “현재의 양호한 경영환경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복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Chiba, Kawasaki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hiba 지역은 컴비나트 북쪽에 소재한 Kyowa Ethylene(KEC)만 남겨두고 남쪽에는 70만-80만톤급 설비를 건설해 2기 체제로 편성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Idemitsu Kosan과 Mitsui Chemicals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연결해 일체화시키는 것 역시 해당 구상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파악된다.
KEC는 1990년대 설립 당시 투자 리스크가 큰 것으로 지적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였으며 앞으로도 잘 포지셔닝한다면 수출 분야와 유도제품 등에서 강점을 발휘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에틸렌 생산설비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awasaki 지역 역시 경영통합을 추진하는 2사가 크래커 통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의 에틸렌 생산설비는 장기적으로 Chiba 2기, Kawasaki 1기로 집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킷카와 교수는 “에틸렌 통폐합 이후에는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사이의 구분도 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석유정제기업들이 크래커를 운영하고 석유화학기업은 유도제품으로 승부하는 모델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은 장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포트폴리오를 혁신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Dow Chemical과 DuPont의 사례처럼 대형 통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경제산업성이 석유화학제품에만 집중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