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분자기계(Molecular Machine)는 새로운 물질 및 센서, 에너지시스템, 반도체,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프랑스 University of Strasbourg 장피에르 소바주 명예교수,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프레이저 스토더트 명예교수, 네덜란드 University of Groningen 베르나르트 페링하 교수를 2016년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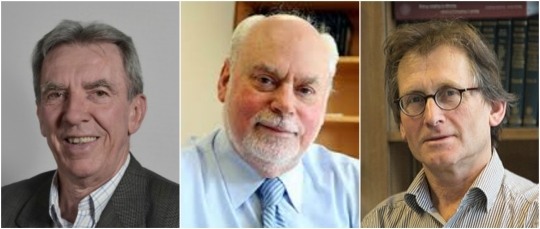 수상자들이 발명한 분자기계란 외부자극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만든 특수한 형태의 분자를 가리키며 크기가 10nm나노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자들이 발명한 분자기계란 외부자극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만든 특수한 형태의 분자를 가리키며 크기가 10nm나노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자들은 일반적으로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강하게 결합하는 공유 결합(화학적 결합)을 통해 연결되지만 분자기계는 기계적인 결합으로 연결되며 연결된 뒤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피에르 소바주 명예교수가 1983년 2개의 고리형 분자를 서로 연결해 최초의 분자기계인 「카테네인(Catenane)」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카테네인은 외부에서 화학적 자극을 주면 고리는 그대로 연결된 채 2개의 분자가 구조를 바꾸며 움직인다.
프레이저 스토더트 명예교수는 1991년 얇은 실 모양의 분자에 고리형 분자를 꿴 형태의 2번째 분자기계 「로탁세인(Rotaxane)」을 개발했으며 로탁세인을 기반으로 분자 리프트, 분자 근육, 분자 기반의 컴퓨터 칩도 제작했다.
베르나르트 페링하 교수는 1999년 분자 모터를 최초 개발하고 이후 분자로 이루어진 나노 자동차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분자기계를 발전시키면 초소형 로봇을 만들어 환자 몸속에 넣어 조종하거나 자동차처럼 움직이도록 할 수도 있으며 반도체 공정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는 실리콘(Silicone) 웨이퍼를 자르고 깎아 만들기 때문에 소형화될수록 제조가 어렵지만 분자기계 합성 방법을 이용하면 분자 하나하나를 조립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분자기계는 주머니처럼 볼록한 부분이 있어 환경에서 유해물질을 분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수은 등 중금속을 포집해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 암세포 치료제 등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분자기계를 대량으로 균일하게 만들거나 실제 기계처럼 정밀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연구성과가 상용화되기까지 최소 2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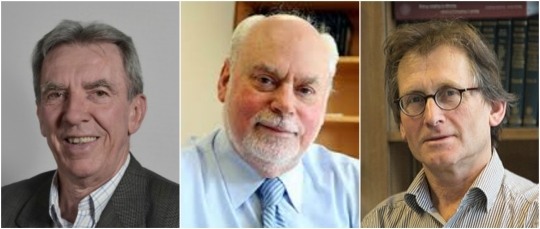 수상자들이 발명한 분자기계란 외부자극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만든 특수한 형태의 분자를 가리키며 크기가 10nm나노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자들이 발명한 분자기계란 외부자극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만든 특수한 형태의 분자를 가리키며 크기가 10nm나노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