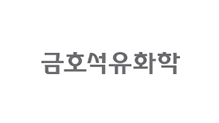국내 화학산업이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화학기업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1980년대부터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게는 기술과 품질에서 치이고 중국, 인디아 등 신흥국에게는 코스트에서 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빗대 샌드위치 신세라고 한탄한 지가 3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각편대에 포위된 태풍 앞의 나룻배 신세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에 치임은 물론 중동이 급부상하고 있고 미국도 기술과 함께 셰일가스를 타고 코스트 경쟁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화학산업에 그치고 않고 모든 산업이 비슷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잘 나가던 조선이 꼬꾸라지고 있고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도 한풀 꺾였으며 반도체만 불황을 걷어내고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수요산업이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데 화학산업이 잘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할 노릇이고, 오죽했으면 화학사업을 때려치우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경영자가 속출하겠는가?
일부에서는 석유화학이 장기간 호황을 누리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은 석유화학 생산능력을 대폭 감축하는 등 생존이 의심스러운 반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에틸렌 증설에 나설 정도로 양호한 경영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경쟁력이 나락으로 떨어져 생사를 헤매고 있고 한국은 앞길이 창창한지 반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아마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화학기업 관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아시아 화학 시장을 주름잡았지만 1990년대부터 석유화학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구조조정을 통해 통폐합에 나섰고 최근에는 추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석유화학 호황이 일본의 선제적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자 너무 성급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이다.
일본은 구조조정을 통해 석유화학 생산능력을 크게 감축하면서 연구개발에 매진해 기능성 화학제품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전자소재, 반도체용 화학제품, 자동차 소재가 그렇고 2-3년 전부터 부상한 태양광 소재, 배터리 소재도 일본이 공급하지 않았다면 시장 형성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압력으로 엔화를 평가절상할 수밖에 없자 가격경쟁력으로는 승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술과 품질로 승부하는 전략을 택했고 오늘날에도 일본 화학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있다.
국내 화학기업들은 어떠한가?
재벌을 중심으로 경제가 재편됨에 따라 효율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기술이나 품질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은 찾아볼 수 없고 오늘날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단가와 수입단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거창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개발 예산이 막대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영업 및 디자인과는 소통도 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퇴근하는 것이 일과이고 놀고먹는 것을 제외하면 업무시간이 반도 되지 않으니 뚜렷한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것이다.
목표의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가운데 약자를 등쳐먹는 습관이 고착화됐기 때문이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