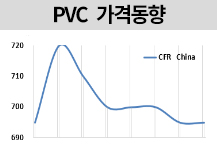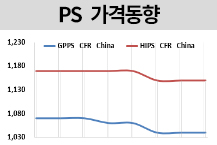유기산(Organic Acid)은 중국이 최대 생산·수출국으로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기산은 다양한 바이오매스 및 당밀, 옥수수 전분 등을 출발원료로 사용함은 물론 화학 합성공법으로도 생산할 수 있으며 공업용을 비롯해 식품, 사료첨가제 등에 다양하게 투입하고 있다.
중국, 미국, EU(유럽연합)가 세계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디아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잇따라 시장에 진출해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핵심 용도는 식품·사료첨가제이며 산미료, 중화제, 산제, 제조용제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공업용은 폴리에스터(Polyester) 및 EP(Engineering Plastic)의 원료로 사용되는 초산이 대부분이나 바이오 숙신산(Succinic Acid) 및 생분해 플래스틱용 PLA(Polylatic Acid) 등의 수요도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연산, 중국산 수입 4만톤 돌파
구연산(Citric Acid)은 공업용으로는 세정제 및 도금 보조제, 식품첨가제로는 탄산음료 및 알코올음료 등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신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츄하이(소주에 약간의 탄산과 과즙을 넣은 일본의 주류) 용도가 주목된다.
식품용과 공업용 수요는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일본 시장규모는 4만5000톤 정도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최대 수입국으로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수입량은 4만3000톤으로 4만톤을 처음 돌파했다.
구연산은 레몬 등 과실에서 추출할 수 있고 주로 배양공법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당밀 등을 출발원료로 하는 표면 발효공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주원료에 고구마 인분, 부원료에 쌀겨를 사용하는 액체배양 혹은 고체배양 공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탄산음료, 제약 원료 이외에 구연산염류로서 구연산 소다, 구연산철 원료로 사용되며 이밖에 합성청주, 조미 엑기스, 과자 등의 용도가 있다. 고화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 츄잉검 등에 적합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에 이은 수입국이나 수입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1년에는 3600톤 상당이었으나 2015년 2200톤 수준으로 줄었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1000톤에 불과해 2016년 전체 수입량이 2000톤 가량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젖산, 중국·타이·네덜란드산 수입 꾸준…
젖산(Lactic Acid)은 산도가 순해 식품용 산미료 이외에 염류로서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감염 소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양조공업, 젖산공업 용도와 같은 공업용도 이외에 유기합성시약, 분석용시약 등 비식품 수요도 있으며 일본은 내수가 전체 수요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전분 등의 당화원료를 활용해 유산균을 발효하고 결정 행정을 거쳐 얻는 발효공법 혹은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를 원료로 사용해 반응시키는 합성공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내수의 대부분을 수입제품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타이, 중국, 네덜란드산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량은 2015년 2471톤을 기록하며 최초로 2만톤을 넘어섰다.
타이가 최대 수입국으로 수입량이 8600톤에 달했으며 중국산이 7000톤으로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산은 3500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상반기 수입량은 98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으나 3개국의 수입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스페인산은 2010년 1000톤에서 2014년 800톤대, 2015년 480톤으로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2016년 상반기에는 230톤으로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산 수입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6년 전체 수입량은 2만톤을 하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푸말산, 유통기한 관련 수요 신장세
푸말산(Fumaric Acid)은 숙신산과 동일하게 무수말레인산(Maleic Anhydride)을 출발원료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당류 등 바이오매스를 발효시키는 방법으로도 생산할 수 있다.
일본은 내수 1만4000-1만5000톤 정도로 식품 용도가 1000톤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입량은 1만1000-1만2000톤이며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다.
식품에 강한 산미를 부여할 수 있어 산미료로서 사용범위가 넓으나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프트드링크, 유산균음료, 유제품음료, 사이다 등에 산미를 부여하는 용도 이외에 식품첨가제의 산미료로서 탄산음료, 사탕, 젤리, 아이스크림류 등 가공식품에도 활용되고 있다.
구연산과 함께 많이 사용되며 흡습성이 적은 특성을 활용해 분말음료 등에도 활용된다.
축산가공식품 및 베이킹 파우더 이외에 반찬 등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용도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푸말산 및 푸말산염 식품용 내수는 나트륨염 제조용 원료 수요를 포함해 2000톤 미만이며 수요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푸말산은 산도가 강한 유기산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특징이 있다.
유지 등에 피복함으로써 산도, pH 조정 등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코팅 푸말산으로서 제재화가 실용화 돼 야채 등의 유통기한을 늘리고 지속성 높은 pH 조정제 등의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숙신산, 바이오제품 용도 확대 기대
숙신산은 물, 알코올에 녹으며 조개류의 풍미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본은 연간 1만톤 가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식품 용도로 내수는 1500톤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숙신산은 무수말레인산을 원료로 생산할 수 있으며 청주, 합성청주, 된장, 간장 등 조미료 및 풍미 첨가 조미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벤젠(Benzene) 및 C4 유분, 부탄(Butane)을 원료로 무수말레인산을 생성해 생산되고 있으나 바이오매스 등의 당질 자원에서 글루코오스를 얻어 생산하는 방법이 확립돼 있다.
대기업들이 해당 방법을 활용한 새로운 공업용도로서 바이오 숙신산 생산을 사업화하고 있다.
사탕수수, 옥수수 등의 재생가능자원을 활용해 각종 수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글루코오스에서 바이오 숙신산을 만들어 PA(Polyamid) 원료로 사용하거나 바이오 숙신산에서 1,4-BDO(Butanediol)를 만들어 우레탄(Urethane) 섬유, PA 원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용도도 개발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숙신산 수입량이 1만3000톤으로 전년대비 1000톤 증가했으며 중국산이 8700톤에 달했고 미국산이 2300톤으로 약 300톤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산, 중국산 증가세 지속…
사과산(Malic Acid)은 공업용으로 소취제, 세제, 산성세제 및 염료 등에 투입되고 있다.
식품용은 산미를 활용해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이외에 츄잉검, 사탕, 젤리, 잼 등 가공식품용 산미료 등으로 사용되며, 의약품 용도는 약용 미용음료, 무염간장 등에 투입되고 있다.
일본은 염류를 포함한 사과산 내수가 약 7500톤 정도이며 공업용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
L-사과산, D-사과산 모두 사과 등의 과실에 포함돼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말레인산, 푸말산을 원료로 가압반응을 통해 정제시킨 후 결정을 얻는 합성공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광학적으로 불활성인 DL-사과산은 식품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찍이 일본도 주요 생산국이었으나 중국, 미국산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중국산이 미국산 수입량을 상회하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DL-사과산 수입은 중국산이 2300톤, 미국산은 1500톤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독일산과 인디아산이 격감해 전체 수입량은 5600톤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상반기 수입량은 2300톤으로 더욱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전체 수입량은 중국산이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나 미국산이 감소해 2015년을 하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석산, 조미료·산미료로 깊은 맛 더해…
주석산(Tartaric Acid)은 식품용도로 탄산음료, 청주 등의 조미료 이외에 산미료로서 활용해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탄산수소나트륨과 함께 사용하는 팽창제, 와인의 산미 조정, 색소 안정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L-주석산은 주석산을 가성소다로 중화해 얻을 수 있으나 주석산 자체는 와인 제조 시에 발생하는 알코올 혹은 와인의 착즙 찌꺼기를 원료로 생산하기 때문에 포도·와인 생산에 따라 생산량·가격이 변동된다.
일본은 염류를 포함한 내수가 4000톤 정도이며 식품 용도가 약 1200톤 정도로 파악된다. 수입량은 800톤-1000톤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수입량은 1079톤이며 스페인산이 600톤 가량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남아프리카 및 칠레와 같은 와인 생산국이 스페인의 뒤를 잇고 있으나 해에 따라 수입 변동폭이 크다.
남아프리카산은 2015년 수입량이 260톤을 기록했으나 칠레는 27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상반기에는 수입량 400톤 가운데 절반 가량을 스페인산이 차지했으나 글로벌 시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입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 lhn@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