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폴리에스터(Polyester) 사 생산 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가격이 톤당 1000달러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후 최근 900달러대 후반으로 떨어졌지만 중소 섬유기업들은 원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리에스터사 제조원가의 70-80%를 원료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PTA 가격이 2018년 내내 초강세를 유지함으로써 화섬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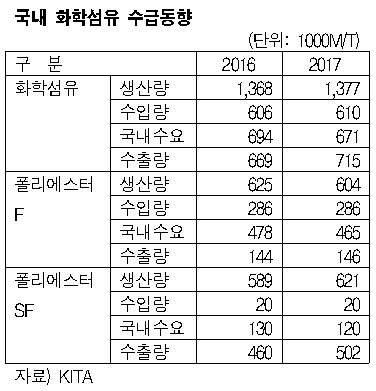 중국산 대체를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산이 국산보다 낮지도 않고 수급이 불안정하며 무엇보다도 순도가 떨어져 국산 사용이 불가피하나 PTA가 고공행진을 계속함으로써 크나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산 대체를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산이 국산보다 낮지도 않고 수급이 불안정하며 무엇보다도 순도가 떨어져 국산 사용이 불가피하나 PTA가 고공행진을 계속함으로써 크나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화섬기업들이 공급가격을 올리면 저가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상황이어서 마진을 줄여가면서 납품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섬기업 관계자는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와 비슷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화학섬유는 장치산업이어서 마진이 좋지 않다고 가동을 멈추지도 못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가동을 멈추면 원료가 굳어버려 추후 녹이는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섬유 시장은 이미 중국산이 많이 유입돼 국내기업의 영역이 크게 좁아지고 있다.
범용제품은 저가 중국산이 많이 유입돼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높아 상대적으로 인력 코스트가 낮은 신흥국에 진출하고 항공기 자제‧부품, 엔지니어링 플래스틱, 메디컬용 고분자 등 첨단기술 집약 사업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2가지 방향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 방적 및 가공기업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인건비 비중이 제조원가의 10%에 육박했고 최근에는 12-13%에 달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화학섬유 관계자는 “섬유산업은 현재 인건비도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진이 낮다”며 “하루 빨리 고부가가치제품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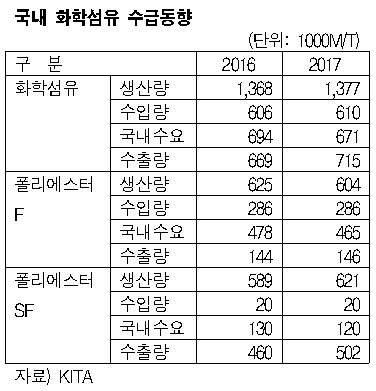 중국산 대체를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산이 국산보다 낮지도 않고 수급이 불안정하며 무엇보다도 순도가 떨어져 국산 사용이 불가피하나 PTA가 고공행진을 계속함으로써 크나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산 대체를 시도하고 있으나 중국산이 국산보다 낮지도 않고 수급이 불안정하며 무엇보다도 순도가 떨어져 국산 사용이 불가피하나 PTA가 고공행진을 계속함으로써 크나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