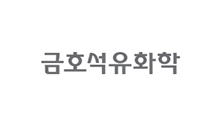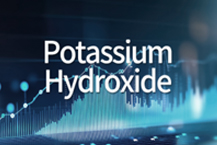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5G 통신의 상용화를 위해 IT 선진국들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기업들이 5G용 화학소재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12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고 2019년 4월에는 삼성전자·LG전자가 5G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동통신 3사가 800MHz폭씩 할당받은 5G의 28GHz 주파수를 상용화하면 5G를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미국은 2018년 10월 세계 최초로 5G 무선통신을 상용화한 후 2019년 4월 최소 30개 지역에서 5G 무선통신을 런칭했고, 유선 인터넷 대용인 5G 무선통신도 5G 이동통신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본도 2019년 9월20일부터 열리는 럭비 월드컵에 맞춰 5G를 사용화하기 위해 주요 통신기업들이 5G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있고, 2020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서 5G 상용화를 선언할 계획이다.
중국은 2020년 전국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동통신 관련기업들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5G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2019년, 늦어도 2020년 5G 서비스를 상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가장 먼저 5G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통신 3사는 5G 서비스 개시에 20억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며, EE는 동부 런던지역에서 9개의 5G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시범서비스 전환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2019년 초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고 3대 통신기업들이 경매에 참여해 2020년에는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정부는 2022년까지 독일 가구 중 98% 이상이 5G를 사용하게 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5G,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산업 분석기관 액센츄어(Accenture Strategy)는 미국 통신기업들이 수년간 5G 무선통신에 2750억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고, 5G 인프라 투자가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5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세계적으로 5G 무선통신 가입자 수가 세계 인구의 15% 수준인 5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도 5G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2030년 2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위치정보 등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은 2030년 7조2000억원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G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5G가 없으면 가상 및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의료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 미래 서비스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5G에 이어 6G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소속 IMT-2000(5G) 무선기술사업팀은 2020년부터 6G 개발에 착수해 2030년 상용화하겠다고 2018년 11월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초부터 6G 연구개발(R&D)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도 2018년 9월 LA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 아메리카(MWCA) 2018에서 연방통신위원회 관계자가 6G 기술개발을 공개했다. 미국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2018년 7월부터 6G 연구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018년 6월 테라헤르츠(THz) 대역 주파수로 100Gbps 속도를 내는 6G 이동통신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일본은 2018년 5월 NTT가 세계 최초로 100Gbps 무선전송 시연에 성공한데 이어 6G에 도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6G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미국이 4G 무선통신 기술을 선점함으로써 GDP가 1000억달러, 미국기업 매출이 1250억달러, 관련 일자리가 84%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2030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6G 통신기술은 4G 서비스보다 100배 이상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필수설비 중심으로 설비투자 본격화
5G를 위한 설비투자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상용화를 목표로 2018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고 6월 주파수 경매비용을 추가하면 초기 투자비가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5G를 상용화한 후 2022년까지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2-3년 동안 설비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 금액은 LTE 상용화 직전인 2010년 6조원을 넘어섰고, 상용화 원년인 2011년 7조원, 2012년 8조원으로 증가한 후 2013년부터 점차 감소해 2015년부터 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5G는 현재 LTE보다 한단계 진화된 통신기술로 초기투자액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텔레콤의 박정호 사장은 “5G는 기지국을 LTE에 비해 3배 이상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며 “4G(LTE)에 8조원 정도 소요됐으나 5G는 10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총 투자액이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SK증권은 “5G 상용화 초기에는 기가급 LTE가 함께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저전력 소형 기지국도 기존 기지국에 비해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어 투자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필수설비 공유가 현실화되면 투자비 부담을 한층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필수설비는 전주(전봇대), 관로 등 전기통신 사업에 필수적인 유선설비로 국내 통신 필수설비의 대부분은 KT가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는 5G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목표로 융합 서비스 전략을 추진하면서 20조원 상당의 R&D투자,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육성을 적극화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가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10개, 빅데이터 센터 100개도 구축한다.
아울러 5G 서비스를 확대 활용하기 위해 5G 플러스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 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5G 서비스를 접목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 새로운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발굴하고 5G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2020년 도쿄올림픽 겨냥 상용화
일본에서도 2019년 5G 시대가 개막된다.
일본 총무성은 2018년 11월 기지국에 대한 지침을 발표한데 이어 2019년 3월 주파수 할당을 결정하고 상용 서비스를 목표인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2019년 개최되는 세계 럭비대회에서 5G를 실연할 예정이다.
주파수대, 전국 보급목표가 결정됨에 따라 관련기업들은 디바이스 사양 책정, 고주파 개발 등 5G 시대에 대응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2019년 3월 주파수 할당 후 2년 이내에 전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5년 이내에 전국의 50%에 5G 고도 특정 기지국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NTT도코모(NTT Docomo)는 2020-2023년 5G 인프라에 1조엔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KDDI도 NTT도코모를 뒤따르고 있다. 소프트뱅크(Softbank)는 5G를 핵심전략으로 설정해 인프라 보급 및 활용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표준규격에서는 5G 이용주파수를 100GHz 이상까지 설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우선 3.7GHz, 4.3GHz, 28GHz에서 이용을 시작할 계획이며 대역폭은 최대 400MHz로 LTE(4세대 이동통신)의 20배를 기대하고 있다.
28GHz는 기존에 없는 고주파대역으로 초고속·대용량통신, 저지연통신에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기지국은 중국산 채용을 보류하고 있으나 후지츠(Fujitsu)는 스웨덴 에릭슨(Ericsson), NEC는 삼성전자와 제휴하는 등 메이저와의 제휴가 잇따르고 있다.
핀란드 노키아(Nokia)는 4G·5G 병설제품을 제안하는 등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사히글래스(Asahi Glass)가 도코모와 연계해 4G로 소규모 영역용 창문형 기지국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5G 대응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대책도 등장하고 있다.
5G는 관련소재가 보급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전송손실을 줄이는 저유전율·유전정접 기판소재 개발이 선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쓰이케미칼(Mitsui Chemicals), 스미토모케미칼(Sumitomo Chemical), 쿠라레(Kuraray)가 LCP(Liquid Crystal Polymer) 소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사히글래스는 불소수지(Fluoro Resin) 생산체제를 확충하고 있다.
미츠비시가스케미칼(Mitsubishi Gas Chemical)은 BT (Bismaleimide-Triazine)계, 파나소닉(Panasonic)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할로겐(Halogen) 미함유 수지를 이용해 저손실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 주도로 상용화 박차
중국도 5G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G는 자동차, 통신기기 뿐만 아니라 공장, 의료, 사회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스마트화할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기술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정부 주도로 5G를 이용한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소재, 전자부품, 제조장치 공급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5G는 2020년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2019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5G 기지국, 데이터센터, 통신네트워크 관련 비즈니스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는 중국에 5G에 필수적인 광디바이스와 고주파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광디바이스는 5G의 고속, 저지연, 대용량 통신에 대응하기 위해 1000Gbps 그레이드에 이어 400Gbps 그레이드를 출시할 계획이며, 고주파장치는 기존 갈륨비소(GaAs) 대신 질화갈륨(GaN) 디바이스를 5G 기지국용으로 투입하기 위해 샘플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5G는 고속통신, 저지연, 동시접속 등 다양한 특징에 따라 모든 휴대폰을 인터넷이나 클라우드로 연결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소비자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스마트의료, 스마트공장 구축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스마트폰 생산기업들은 5G 상용화에 대비한 연구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화웨이(Huawei), 오포(Oppo) 등은 주로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중저가 모델을 공급했으나 최근에는 가격이 70만원 이상인 고가 모델 라인업을 확충해 유럽, 인디아, 일본에서 시장점유율을 급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다.
고가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 기술혁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삼성전자, 12GB 모바일 D램 개발
삼성전자는 12GB LPDDR4X 모바일 D램을 양산한다.
12GB LPDDR4X 모바일 D램은 2세대 10나노급 16기가비트 칩을 6개 탑재함으로써 기존 8GB 모바일 D램 보다 용량을 1.5배 높여 역대 최대용량을 구현했다.
일반적인 울트라 슬림 노트북에 탑재된 8GB D램 모듈보다도 높은 용량의 D램 패키지를 모바일 기기에 적용하게 됐고, 폴더블(Foldable) 폰과 같이 화면이 2배 이상 넓어진 초고해상도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앱을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통신기업들은 차세대 스마트폰에 5개 이상의 카메라 모듈, 대형·멀티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프로세서, 5G 통신서비스 등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높은 용량의 D램을 탑재하면 시스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GB 대용량을 1개의 패키지로 구현함으로써 소비전력 효율을 높이고 배터리 탑재 면적도 키울 수 있다.
12GB LPDDR4X 모바일 D램은 현재 모바일기기에 사용되는 가장 빠른 속도인 초당 34.1GB 속도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으며, 패키지 두께도 1.1mm에 불과해 모바일기기를 더 슬림하게 설계할 수 있다.
SK텔레콤, 엣지 컴퓨팅 오픈 플랫폼 구축
SK텔레콤은 5G 이동통신 응답속도를 높여주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 MEC)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협력기업들에게 제공한다.
MEC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전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다.
5G 기지국이나 교환기에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설치해 전송구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5G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데이터센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4단계 과정을 거쳤으나 MEC 기술을 통해 최대 2단계로 단축함으로써 데이터 지연시간이 최대 60% 줄어든다.
SK텔레콤은 협력기업들이 쉽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MEC 플랫폼을 개방할 방침이어서 개발기업들은 초저지연 특성이 필요한 서비스를 SK텔레콤 MEC 플랫폼과 연동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에 MEC를 적용해 5G로 구동되는 여러 로봇의 응답속도를 올릴 수 있고, 빠른 응답속도를 요구하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서비스, 클라우드 게임. 자율주행과 자동차 관제, 실시간 생방송 등에서도 MEC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제공해 협력기업들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갤럭시 S10 5G에 겹합기술 탑재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5G-LTE 결합 기술개발 및 검증을 마치고 4월 출시한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에 기본 탑재했다.
5G-LTE 결합 기술은 5G와 LTE 네트워크를 함께 데이터 송수신에 활용해 전송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기술로, 양사는 갤럭시 S10 5G를 통해 5G의 1.5Gbps와 LTE의 1.15Gbps 전송속도를 묶어 최대 2.65Gbps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성공했다.
개발기술을 탑재한 5G 스마트폰은 5G만 활용할 때보다 전송속도가 80%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HD 영화 1편을 6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고, 일반 영상보다 5배 용량이 큰 VR 콘텐츠도 약 30초만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SK텔레콤 출시 모델은 초기부터 2.6Gbps급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최대 2.7Gbps로 한번 더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밀리미터파 전송 관련특허 출원 급증
5G 이동통신이 초고속, 초저지연(실시간), 초연결을 3대 비전으로 5G를 실현할 수 있는 초고주파인 밀리미터파(mmWave) 전송을 표준규격에 도입함에 따라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밀리미터파 전송 관련특허 출원은 2013년 80건, 2014년 72건에 불과했지만 밀리미터파를 5G 주파수 대역으로 하는 승인이 이루어진 2015년에는 123건, 2016년 124건, 2017년 100건에 달했다.
밀리미터파는 주파수 대역이 30-300GHz로 넓고 파장이 1-10mm인 전자기파를 말한다.
트래픽 폭증에 따른 과부하나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소형 셀 기술,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적의 빔을 제공하는 에너지 집중형 빔-포밍 기술, 전송속도 향상을 위한 대용량 다중 입출력(Massive MIMO) 기술을 실현할 수 있다.
4G까지는 도달범위가 넓고 투과력도 좋은 6G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을 사용했지만 저주파 대역 사용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4G보다 20배 이상 빠른 속도를 지원하기 위한 5G에서는 24GHz 이상의 초고주파인 밀리미터파 대역을 이용해 전송 대역폭을 기존(10-20MHz)보다 10-100배(100MHz-1GHz)로 확장해 높은 데이터율과 큰 용량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전자, 퀄컴(Qualcomm), 인텔(Intel), LG전자, 화웨이 등 글로벌 통신장비 관련기업들이 전체 출원의 50% 정도를 차지했고 연구소와 산학협력단 출원이 30% 이상으로 뒤를 이었다. ▶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