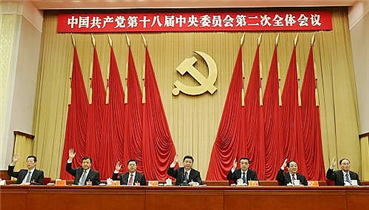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수출규제에 나선 지 100일이 훌쩍 지나갔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수출규제 이후 100일 동안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해 불소계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7건에 대해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본이 WTO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뜨문뜨문 수출을 허가할 뿐 한국을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에는 변함이 없어 안심하고 있을 단계는 아니다.
국내에서도 화학기업을 중심으로 3개 화학소재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일본산 대체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 다행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본산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꾸준히 확대하고 전문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산 수입을 그리 쉽게 중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화학기업들이 3개 화학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적용해 하자가 없을 정도로 순도를 높여야 하지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20-30년 동안 연구개발에 매달려 고순도화한 것을 국내기업들이 2-3년도 아닌 2-3개월만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불신하던 국내기업을 신뢰하면서 일본산 대체에 나섰다는 점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물론, 다급한 것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고 화학기업은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횡포를 계기로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3개 화학소재에 그치지 않고 일본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스페셜티 화학소재의 국산화를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스페셜티 화학소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자, 배터리 등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산업용 소재 전반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중국도 사드 보복에 나선 경험이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립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큰 낭패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자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에 불과해 추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일부에서는 아르헨티나나 필리핀이 어깨 넘어라고 한탄하고 있다.
반도체, 전자, 자동차, 배터리용 스페셜티 화학소재 개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과 화학기업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일본기업들이 화학소재를 개발하면서 국내 대기업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것처럼 상호 협력하지 않고서는 스페셜티 소재 개발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화학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지 않고 동반 성장하겠다는 의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이나 미국·유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인수하지 결코 기술을 탈취하지는 않는 반면 한국은 그러한 신뢰관계가 망가져 있다. 대기업들이 납품을 빌미로 기술설계도를 요구한 후 틈만 나면 탈취를 서슴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기술을 탈취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화학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이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면 납품을 중단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 한곳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통해야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상호신뢰 관계 여부가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