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올레핀 시장은 중국의 증설과 친환경 트레드 강화의 영향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기업들이 통합을 추진해 주목된다.
미쓰이케미칼(MCI: Mitsui Chemicals)과 스미토모케미칼(SCC: Sumitomo Chemical)은 폴리올레핀 사업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2002년 4월 폴리올레핀 사업 합작법인 SMPO를 설립했으나 사업 통합에 난항을 겪어 2003년 10월 합작에서 철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확대와 탄소중립 트렌드 강화로 약 200만톤의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을 보유한 지바현(Chiba) 게이요(Keiyo) 지구에서 공동운영을 통한 합리화 검토가 시작됨에 따라 대표적인 다운스트림인 폴리올레핀(Polyolefin) 사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확대와 탄소중립 트렌드 강화로 약 200만톤의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을 보유한 지바현(Chiba) 게이요(Keiyo) 지구에서 공동운영을 통한 합리화 검토가 시작됨에 따라 대표적인 다운스트림인 폴리올레핀(Polyolefin) 사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게이요 지구에서는 미쓰이케미칼이 65%, 이데미츠코산(Idemitsu Kosan)가 35% 지분을 보유한 프라임폴리머(Prime Polymer)가 PE(Polyethylene) 60만톤, PP(Polypropylene) 106만톤 설비를, 스미토모케미칼이 PE 35만5000톤, PP 30만톤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프라임폴리머와 스미토모케미칼의 PE 합작법인 Japan Evolue 등도 게이요 지구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예상과 달리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규모 신증설한 생산능력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잉여물량이 아시아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일본 플래스틱연맹은 중국의 2023년 플래스틱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 2000만톤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쓰이케미칼과 스미토모케미칼은 설비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의 한계를 게이요 지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연계로 극복할 방침이다.
양사의 합작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그린원료 조달 및 리사이클 등 탄소중립과 순환형 사회 지원 기술을 조합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라임폴리머는 모기업 미쓰이케미칼의 바이오 나프타(Naphtha) 베이스 에틸렌을 이용해 바이오 폴리올레핀 생산체제를 정비했으며, 스미토모케미칼은 2030년을 목표로 20만톤 바이오 에탄올(Ethanol) 베이스 에틸렌 설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스미토모케미칼은 2026년 3월까지 폐자동차에서 회수 가능한 PP(Polypropylene) 소재를 이용하는 폐플래스틱 MR(Material Recycle) 설비를 지바현에 건설할 계획이며, 프라임폴리머 역시 2025년 모기업 이데미츠코산이 CR(Chemical Recycle) 설비를 가동할 예정이어서 재생자재 공동조달 등 스케일 메리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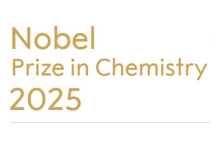










 그러나 중국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확대와 탄소중립 트렌드 강화로 약 200만톤의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을 보유한 지바현(Chiba) 게이요(Keiyo) 지구에서 공동운영을 통한 합리화 검토가 시작됨에 따라 대표적인 다운스트림인 폴리올레핀(Polyolefin) 사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확대와 탄소중립 트렌드 강화로 약 200만톤의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을 보유한 지바현(Chiba) 게이요(Keiyo) 지구에서 공동운영을 통한 합리화 검토가 시작됨에 따라 대표적인 다운스트림인 폴리올레핀(Polyolefin) 사업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