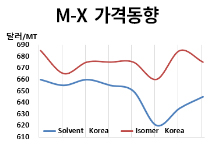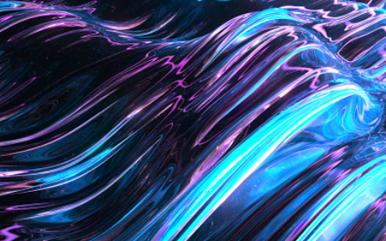국내 가성소다 시장이 석유화학의 전철을 답습할지 우려된다.
아시아 가성소다 시장은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수익성 저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성소다는 톤당 370-380달러 수준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신증설을 통해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했으나 건설을 중심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자 인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수출을 확대해 전체적으로 공급과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성소다는 섬유, 의약, 제지, 세제 등의 기초 원료로 투입되며 화학산업에서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전기자동차용 알루미늄 사용량이 늘어나고 배터리 양극재 생산 공정에서도 불순물 제거를 위해 가성소다를 사용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경기침체에 전기자동차 수요가 줄어들어 반도체 세정공정 등 새로운 수요처 확보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가성소다 현물가격은 FOB NE Asia 톤당 380달러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82-83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산이 대량 유입되면서 공급과잉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은 과잉물량을 밀어냄으로써 내수가격은 톤당 3300-3500위안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수입가격으로 환산하면 450-500달러 수준으로 아시아 현물가격을 톤당 100달러 정도 웃돌고 있다.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중국이 신증설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고 잉여물량을 수출로 해소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화학기업들이 일본 생산능력을 감축하는 한편으로 타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투자를 통해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수요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디아 투자도 적극화하고 있다.
중국이 가성소다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자급률을 높여 수입을 줄이려는 의지와 함께 상대적으로 코스트가 낮은 석탄화력을 이용하는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전력 코스트가 높아 자체 생산은 줄이면서 동남아․인디아에 진출하고 있다.
반면, 국내 가성소다 생산기업들은 국내 신증설에 열을 올릴 뿐 동남아 투자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배터리․반도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생산을 확대해 동남아․인디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내 가성소다 생산능력은 한화솔루션이 84만톤으로 최대이고 LG화학 72만8000톤, 롯데정밀화학 35만톤, 백광산업 19만톤, OCI 11만톤으로 파악된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여수공장을 증설해 총 생산능력을 1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배터리 전구체용 수요가 2022년 5만톤 이상에서 2028년에는 국내수요의 20% 수준으로 확대되고 반도체용 수요가 추가 증가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한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전력요금이 낮은 편이나 국제유가 강세에 천연가스까지 높은 수준을 장기화함으로써 머지않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단번에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가성소다 생산기업들은 전력요금이 20-30% 인상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