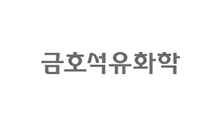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석유화학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불황 국면이 계속되고 있지만, 특히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심각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신증설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고 중국 경제까지 침체됨으로써 수익성 악화라는 질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신증설을 단행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나프타 베이스의 한계를 모르는 바도 아닌데 왜 유독 한국기업만 고전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아마도 코스트와 자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수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중국이 생산능력을 확대하면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SKY도 모자라 관악산 정기까지 받았다는 최우수 인재들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후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흑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 침체에 부동산 버블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공급과잉의 질곡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기미가 뚜렷하다.
무엇 때문인가. 한국에는 없는 인재가 많아서일까? 아니면 코스트 경쟁력이 뛰어난 원자재를 확보했기 때문일까? 모두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듯이 일본이나 중국 모두 코스트가 양호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재 풀도 그리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를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스팀 크래커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석유화학 플랜트가 노후화돼 경쟁력이 밑바닥 수준이나 사업을 다원화함으로써 보완하고 있다. 특히, 전자․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자동차 소재, 배터리 소재를 특화함으로써 석유화학을 보완함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촉매를 비롯해 각종 첨가제도 일본산이 아니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지경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전자, 반도체 사업 육성에 실패해 한국에 1위 자리를 내주었으나 소재 사업을 특화함으로써 커버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10년 이상 성장률 5%가 넘는 고도성장을 통해 글로벌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20년 가까이 석유화학제품의 블랙홀로 작용했으나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고 미국의 견제가 크게 작동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동남아시아․인디아 수출을 확대하고 아프리카를 적극 개척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크게 역할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석유화학은 급격한 신증설을 통해 자급률을 끌어올리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플랜트를 도태시켜 수급밸런스를 맞추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일체화를 통해 대형화와 함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슨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
코스트 경쟁력이 뛰어난 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가? 아마도 뛰어난 오퍼레이션 능력을 활용해 고정 코스트를 낮추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무대책이 상책이라면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