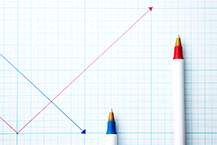한국이 플래스틱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20-30년 전부터 폐플래스틱 문제가 심각했으나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배달문화가 정착되면서 폐플래스틱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이 중론이다.
석유화학산업계에서 해중합이 이슈화되면서 해결책을 찾는가 했으나 폐플래스틱을 수거하는 군소기업들과 갈등을 빚었을 뿐 진전이 없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분리수거 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폐플래스틱, 폐비닐, PET병 3가지로 분리해 수거할 뿐이고 재질별 분리·수거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차도 커피 가맹점이나 편의점의 플래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환경부의 미숙한 일처리와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맞물리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반면, 일본은 폐플래스틱·비닐 수거에서 수거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수거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재질을 가리지 않고 수거한 후 열처리를 통해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한단계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도 폐플래스틱 수거체계를 효율화함은 물론 기술 개발을 통해 재질을 가리지 않고 수거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거의 효율화보다는 이권다툼 성격이 강하고, 일부 벤처기업들이 열분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나 실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플래스틱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방안을 다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산량을 규제하기는 어렵더라도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생산과 소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정 비닐류나 유색 스티로폼과 같이 재활용 불가능한 플래스틱은 생산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분리·수거 시스템을 더 세분화·선진화하고 석유화학과 수거업자들이 상호 협력해 될 수 있으면 수거한 플래스틱을 CR(Chemical Recycle)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해에 몇십년, 몇백년 걸릴 수 있는 폐플래스틱을 매립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소각 처리는 최소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생분해가 가능한 바이오 플래스틱 생산을 확대해 일반 플래스틱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국내 화학기업들이 바이오 플래스틱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기대가 크나 그린워싱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설마 LG화학, CJ제일제당, SKC 등 대기업들이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최근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PLA 투자가 활발하고 PHA, PGA, PBAT도 부상하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중국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바이오 플래스틱도 범용 플래스틱과 마찬가지로 공급과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술적 우위도 필요하지만 시장을 선점하지 않고서는 허를 찔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폐플래스틱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플래스틱 생산·소비 대국으로서 해양 플래스틱 쓰레기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는 점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