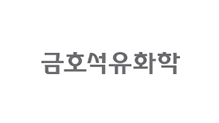국내 화학산업에 2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하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화학제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사드 보복을 노골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석유화학은 중국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2가지 측면 모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설마 하는 심정으로 중국이 함부로 사드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빨리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석유화학 관계자들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볼 때 중국이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사드 보복에 나섰다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2016년 하반기에도 중국이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줄이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기는 했으나 확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석유화학제품의 국제시세 변화를 보면 예전과는 다른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3월16-17일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동북아시아의 하락폭이 동남아시아를 크게 웃도는 현상이 나타났다. 종종 있어왔던 현상이지만 여러 품목에 걸쳐 동시에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국이 한국산 구매를 줄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에틸렌은 FOB Korea가 1120달러로 80달러 폭락한 반면 CFR SEA는 1060달러로 40달러 급락하는데 그쳤고, 프로필렌도 FOB Korea는 860달러로 51달러 폭락한 반면 CFR SEA는 880달러로 24달러 하락에 머물렀다.
GPPS도 CFR China가 1360달러로 70달러 폭락한 반면 CFR SEA는 1398달러로 48달러 급락하는데 그쳤고 HIPS 역시 CFR China는 1449달러로 76달러 폭락한 반면 CFR SEA는 1498달러로 27달러 떨어지는데 그쳤다.
특히, PA는 CFR China가 940달러로 50달러 폭락한 반면 CFR SEA는 1100달러로 55달러 폭등했고, DOP는 CFR China가 950달러로 60달러 폭락한 반면 CFR SEA는 1150달러로 50달러 급등했다.
물론, 상승 또는 하락세가 대비되는 석유화학제품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개연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북아시아는 상승폭이 크고 동남아시아는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동남아시아는 동북아시아에 비해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기보수 또는 가동중단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3월 중순에는 동남아시아 및 인디아의 신규가동 또는 재가동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훨씬 적었다. PA나 DOP는 정반대의 폭락과 폭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자국기업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드 보복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선다면 폴리머에 집중되고 합섬원료를 거쳐 모노머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기우로 판명날 수도 있고 모두가 그러하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모노머부터 사드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면 정면승부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노머는 대체수단이 없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