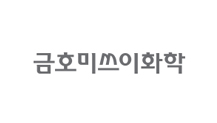일본 FDK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삼성SDI가 전고체전지 개발을 적극화하고 있다.
FDK는 2019년 4월부터 소형 전고체전지 중 시간당 500μA의 대용량제품 샘플을 출하할 예정이며 기존 일반 전지와 함께 용도를 발굴하고 있다. 전자부품의 컨덴서 대체용으로도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제안을 확대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채용실적을 거둔 철도와 함께 니켈수소전지 등을 통해 자동차용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공기수소2차전지는 재생가능에너지용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2019년을 시장 공략을 위한 첫해로 설정하고 신제품 공급은 물론 신규용도 개척을 본격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FDK는 소형 전고체전지를 전략제품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용도를 개척하고 있다.
2017년 말 샘플 출하를 시작한 용량 140μA급 일반 전지와 함께 500μA 대용량제품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전자기기 동작용 축전지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콘덴서를 대체함으로써 프린트 배선판 소형화 및 부품 수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제안을 강화하고 있다.
파트너 협력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oT(사물인터넷) 기기, 웨어러블(Wearable) 및 히어러블(Hearable) 등 소형기기 뿐만 아니라 산업기기, 자동차, 기지국 개척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표면실장에 대응이 가능한 전지가 없었으나 니즈를 반영해 라인업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용은 EV(전기자동차)용 대용량 축전지가 아니라 엔진 스타트용 납축전지 대체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니켈수소전지로 수요처와 거래를 한 사례가 있으며 소형 전고체전지의 자동차 채용을 기대하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는 그동안 철도용을 중심으로 공략했으나 고도의 전장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연구개발(R&D)도 강화하고 있다.
전고체전지는 배터리 및 전자부품 기술 및 생산설비를 조합해 그동안 실현이 불가능했던 소형화, 성능, 양산성을 실현했으며 앞으로도 융합영역에서 신제품 창출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회로나 파워디바이스와 복합화해 모듈·시스템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공기수소2차저지 등 차세대 전지의 사업화를 위한 검토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 면에서는 IoT, AI(인공지능) 도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IoT는 카메라를 통해 현장 개선을 위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AI는 검사공정에서 불량품을 걸러내는데 활용하고 데이터 축적 및 분석 등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
후지츠(Fujitsu) 그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디지털화를 추진해 경쟁력 향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동차기업들도 최근 LiB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세대 배터리로 알려진 전고체전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요타자동차(Toyota)는 2022년까지 전고체전지를 직접 개발해 상용화할 계획이며, 피스커(Fisker) 역시 2020년 초반 양산을 목표로 전고체전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혼다(Honda), 닛산(Nissan), BMW, 폭스바겐(Volkswagen)도 전고체전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SDI와 현대자동차가 전고체전지 개발에 적극적이다.
삼성SDI는 2019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혁신 소재·디자인을 적용한 차세대 배터리 셀을 전시했다.
전시공간을 EV-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전동차의 Mass & Prestige화, LVS(저전압 시스템)-내연기관의 효율성 제고 등 3가지 스토리로 구성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한번 충전으로 6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셀, 순수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별 배터리 셀 라인업, 저전압 시스템 팩 등 다양한 첨단제품을 공개했다.
특히,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여서 안전성이 높은 전고체전지 기술 로드맵도 선보였다. 전고체전지는 1회 충전 주행거리도 700km에 달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EV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는 2017년 설립한 개방형 혁신센터 현대크래들을 통해 미국 전고체전지 개발기업인 Ionic Materials에 투자한다고 2018년 7월10일 발표한 바있다.
Ionic Materials이 주로 기존 LiB에 사용하는 액체 전해질을 대체하기 위한 고체 전해질 폴리머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개발에 직접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현재 EV에 LG화학 등 국내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도입하고 있으나 미국의 배터리 개발기업에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미루어 전고체전지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Ionic Materials은 매사추세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프랑스 토탈(Total), 르노(Renault), 일본 닛산, 미츠비시자동차(Mitsubishi Motor) 등이 투자해 설립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