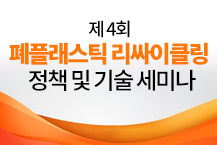LG화학(대표 신학철)이 제조한 일부 배터리셀에서 ESS(Energy Storage System)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조결함이 확인됐다.
민관 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 관계자는 “다수의 사고가 동일공장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산한 배터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해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LG화학 일부 배터리셀에서 극판접힘, 절단 불량, 화학물질 코팅 불량 등 내부 단락을 일으키는 제조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배터리셀 제조결함이 독자적으로 화재 원인이 되는 내부 단락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운영조건과 결합해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위가 배터리셀 제조결함을 직접적 화재원인으로 지목하진 않았지만 간접원인으로 명시함에 따라 책임에 대한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8월 이후 발생한 ESS 화재사고 총 23건 가운데 LG화학 배터리셀이 사용된 것은 12건, 삼성SDI 8건, 기타가 3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극판접힘과 절단불량을 모사한 배터리셀을 제작해 충방전 반복시험을 180회 이상 수행했을 때에도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조사위 측이 배터리셀 제조결함을 화재 간접원인으로 제시한 이유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사위가 조사 결과에 일부 배터리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고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배경에 대해 조사위 대변인을 맡은 최윤석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현장에 남아 있는 로그 데이터나 정황 증거, 이론적인 화재 메커니즘, 메커니즘이 실현되는지에 대한 모사실험 결과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ESS 화재사고 23건 가운데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 중에, 6건은 충방전 과정에, 나머지 3건은 설치·시공 중에 각각 발행했다.
사고원인으로는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보호체계 미흡 등 4개 요인이 확인됐다.
먼저,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은 배터리 시스템에 전기충격(과전압·과전류)이 유입될 때 배터리 보호체계인 랙 퓨즈가 차단하지 못해 2차 단락사고에 따른 화재 발생이 일어났다.
또 운영환경 관리 미흡은 산지·해안가에 설치된 ESS 모듈에서 큰 일교차로 결로 생성·건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먼지가 눌러붙어 화재가 발생했고 배터리 보관불량, 오결선 등 ESS 설치 부주의에 따른 화재 발생도 확인됐다.
아울러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전력관리시스템(PMS),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시스템통합(SI) 등 ESS를 구성하는 각 부품을 제조한 곳이 서로 달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조사됐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