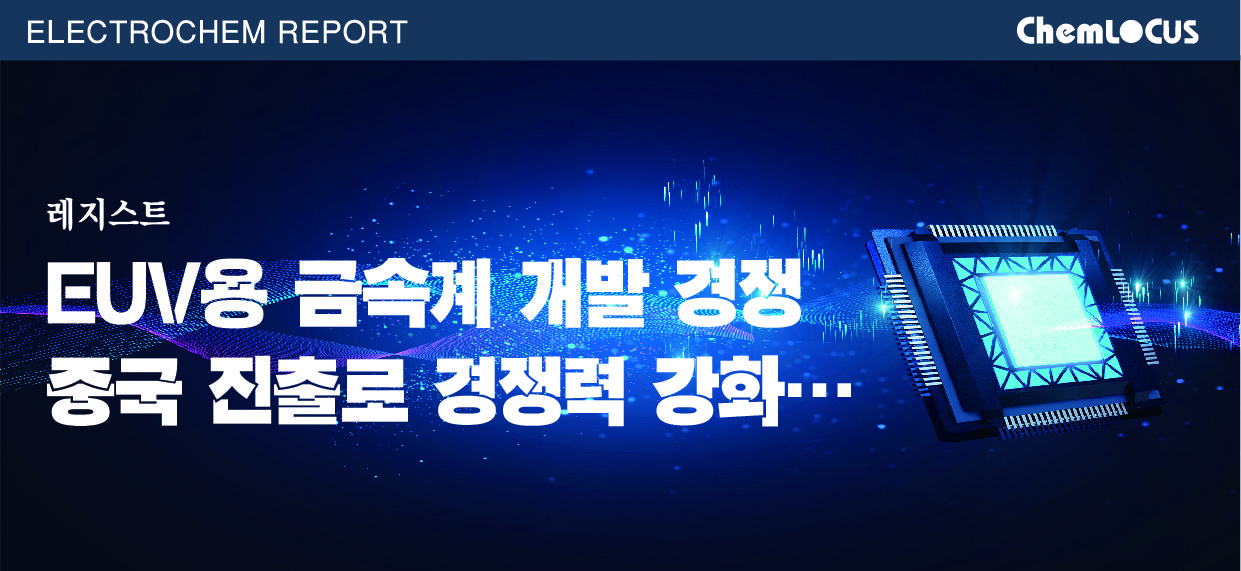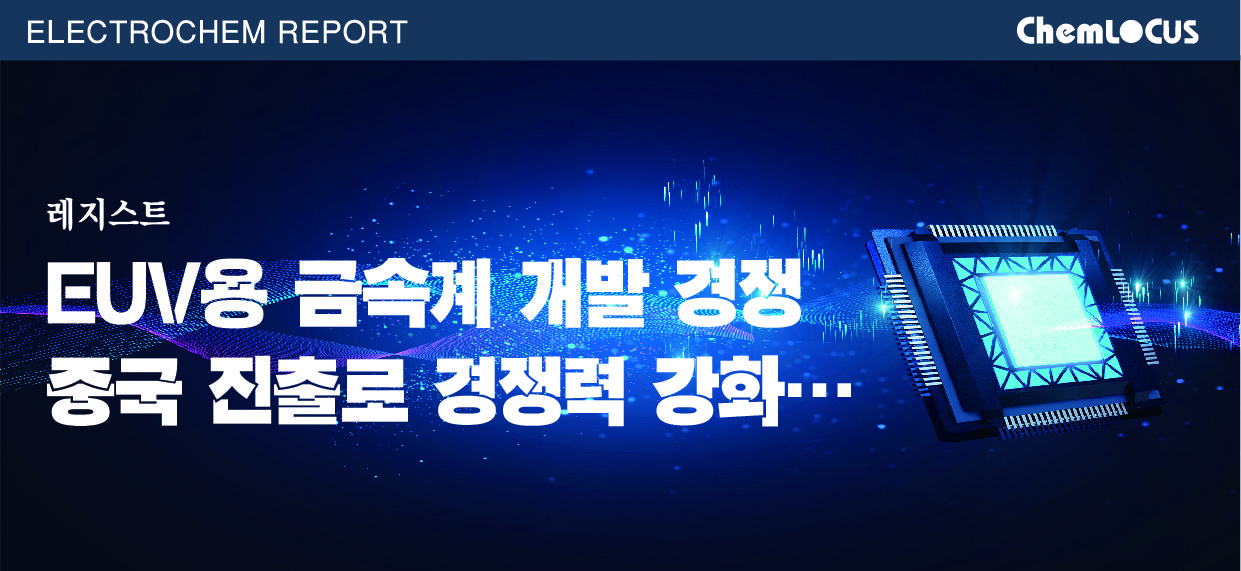
차차세대 초미세 반도체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EUV(극자외선) 금속 레지스트(Resist)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금속 레지스트는 생산성, 코스트 개선이 시급하지만 기존 화학증폭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면서 레지스트 생산기업들은 10년 전부터 주석, 하프늄 등을 사용한 금속 레지스트 개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금속 레지스트가 파장 13.5나노미터의 극자외선에 대한 흡수율이 유기물보다 우수하고 해상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JSR·램리서치, 웨트·드라이공법으로 대결
JSR은 금속 레지스트가 선폭 거칠기(LWR), 선 가장자리 거칠기(LER) 등 반도체 프로세스 미세화에 필수적인 회로패턴의 형상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에칭에 대한 내성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기존 화학증폭형 레지스트와 같한 웨트공법으로 개발하고 있다.
반면, 미국 반도체 제조장치 메이저 램리서치(Lam Research)는 CVD(화학기상성장)를 사용한 드라이공법을 채용하고 있다.
최근 고개구도 EUV 노광기가 개발되며 1나노미터대 프로세스 기술 상용화가 기대돼 금속 레지스트 개발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유기소재를 사용하는 화학증폭형 레지스트는 2나노미터 프로세스까지 독점하고 있다.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는 2025년경 2나노미터 프로세스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속 레지스트는 현재 개발단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ASML의 고개구도 노광기 공급체제가 불충분해 시기상 투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1나노미터대 반도체 생산부터는 고개구도 노광기와 금속 레지스트를 사용하는 EUV 리소그래피(회로전사)가 본격화되고 D램 메이저가 금속 레지스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JSR, 화학증폭형처럼 웨트공법 채용
JSR은 2007년 설립된 금속 레지스트 전문기업인 미국의 인프리아(Inpria)를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인프리아는 주석산화물을 주요 성분으로 취하는 EUV 금속 레지스트 생산실적이 2500갤런에 달하고 삼성전자, 인텔(Intel), TSMC의 투자를 받고 있다. 과거 TOK도 출자한 바 있다.
JSR은 인프리아가 565억엔에 달하는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1년 10월 인수했고 2022년 9월 인프리아를 통해 SK하이닉스와 D램용 금속 레지스트 공동 개발에 착수하는 등 금속 레지스트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속 레지스트는 아직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패턴 결함이 있고 높은 프로세스 코스트 등도 과제가 되고 있으나 JSR은 고개구도 노광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화학증폭형에 밀리지 않도록 금속 레지스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해상도 기술 및 소재와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또 주석 외의 금속은 제거함으로써 반도체 미세화를 가로막고 있는 불순물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JSR은 수십년 동안 벨기에 IMEC와 협업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에는 EUV 리소그래피 생산을 위한 합작기업 EUV RMQC를 설립했다.
화학증폭형 EUV 레지스트 주력기지를 EUV RMQC로, EUV 금속 레지스트 생산기지는 인프라이의 미국 오리건 공장(생산능력 4000갤런)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있다.
JSR은 해외사업에서도 설계‧생산을 주도하고 IMEC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서며 IBM과는 레지스트 개발에 협력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램리서치, 미래 내다보며 드라이공법 개발
램리서치는 현상액을 사용하지 않는 드라이 프로세스로 EUV 금속 드라이 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있다.
신규 진출기업이나 JSR과 마찬가지로 IMEC와 협업하며 2020년 ASML, IMEC와 함께 드라이 레지스트 공동 개발에 착수했고 2022년 7월에는 미츠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 그룹의 미국 Gelest 및 인테그리스(Entegris) 등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업에게 드라이 금속 레지스트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램리서치가 개발하고 있는 EUV 금속 드라이 레지스트는 파장 13.5나노미터의 EUV 광에 대한 흡수율이 액체 레지스트보다 몇배 우수하며 감광 레이저 광량이 적어도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어 생산성 개선 및 코스트 저감이 기대된다. 원료 사용량도 액상 레지스트의 10-2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친환경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속 레지스트는 화학증폭형보다 에칭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레지스트 패턴 형성을 방해하는 LER, LWR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상액을 사용하지 않는 드라이 프로세스여서 레지스트 패턴 붕괴를 막는 것 또한 가능해 차세대 D램, 로직 프로세스용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드라이 프로세스는 스핀 도포하는 화학증학형 레지스트와 달리 CVD법으로 약제를 추적하기 때문에 금속계 프리커서(전구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램리서치는 드라이 레지스트 대량생산을 위해 견고한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인테그리스, Gelest로부터 프리커서를 공급받는 체제를 확립했다. 인테그리스, Gelest는 연구개발팀을 편성해 ASML의 고개구도(0.55) 노광기용 레지스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고개구도 노광기와 금속 레지스트를 사용하는 세대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후막 등 제어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라이 레지스트는 장점이 많으나 전자소재 생산기업이 신규 진출하기에는 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드라이 레지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소재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결함이 많아 반도체 생산기업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램리서치는 앞으로 5년 동안 드라이 레지스트의 과제를 해결하고 반도체 생산기업으로부터 채용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2나노미터 이하 시대가 찾아오면 금속 레지스트의 역할이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F2(불소다이머), 고굴절율 액침액 등 과거 각광받던 기술들이 사장된 것처럼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화학증폭형 레지스트의 시대가 저물고 금속 레지스트가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생산기업들이 다수이다.
TOK는 신기술 개발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레지스트용 원료 메이저인 Toyo Gosei는 금속 레지스트 등 신기술을 주목하면서 고개구도 노광기의 불순물 제거능력이 향상되면 고순도 레지스트 원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제조 프로세스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프로세스 미세화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나 레지스트 개발을 둘러싼 경쟁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Chem, 디스플레이용으로 중국 시장 진출
eChem Solutions은 중국 레지스트 시장에 진출한다.
디스플레이용 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있는 일본 eChem Solutions은 중국기업과 협업하며 충칭(Chongqing)에 디스플레이용 레지스트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약 100억엔을 투자해 TFT(박막 트랜지스터)용과 패널 레벨 패키지(PLP)용 레지스트를 월 1000톤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2022년 말까지 건설하고 2023년부터 컬러 레지스트 생산을 시작하며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용 레지스트 시장에도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칭시는 쓰촨(Sichuan) 지구에 디스플레이기업들이 집적돼 있으나 레지스트 생산기업은 없어 수요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Chem Solutions은 최근 충칭시 비산구(Bishan) 투자부문 및 여러 중국기업과 함께 Chongqing CEMI를 설립하고 레지스트 소재 공급 및 생산 노하우, 공장 운영 관련 기술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타이완에 기술을 라이선스한 경험을 살려 Chongqing CEMI에서도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LCD(Liquid Crystal Display) 생산능력의 70%를 장악하는 LCD 대국이며 최대 메이저 BOE 뿐만 아니라 TCL SCOT, HKC 등 패널 대기업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충칭시 쓰촨지구에는 LCD 생산기업들이 집적돼 중국 전체 생산능력의 30%를 담당하고 있으나 레지스트 생산기업은 없고 상하이(Shanghai), 쑤저우(Suzhou) 등 다른 도시부에서 생산된 레지스트를 조달하고 있다.
eChem Solutions은 최근 충칭 R&D(연구개발) 센터를 완공했으며 3.5세대 TFT, 컬러필터 포토 리소그래피, 5세대 PLP용 전기동 도금 라인 등을 완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건설할 충칭 공장에서는 TFT용, PLP용 레지스트를 생산할 예정이며 PLP용은 이미 마이크로 및 미니 LED 배선용 샘플을 공급하면서 조기 상용화를 도모하고 있다.
반도체용도 상업화 준비
재배선층(RDL)용 레지스트도 개발하고 있다.
PLP 프로세스는 LED 배선, 반도체 패키지 등 차세대 기술이 주목받고 있으나 전기동 도금이 필요해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생산 가능한 지역이 한정적이나 충칭에는 도금 전용 산업단지가 있어 패널 생산기업들이 PLP에 진출하기 쉬운 환경으로 파악된다.
2023년부터 블랙 레지스트 등 컬러 레지스트 생산을 시작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용 레지스트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용 기술을 횡적으로 전개해 g‧h‧i선용 레지스트를 생산하며 반도체용에서만 약 300억엔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칭시 쓰촨지구에 경쟁기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Chongqing CEMI가 현지 레지스트 생산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이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수요기업들은 일본기업의 기술이 뛰어나도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고 현지 편광판, 컬러 레지스트 생산기업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수직계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지 진출에 따른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랙 레지스트는 미츠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 그룹과 NSSMC(Nippon Steel & Sumitomo Metal) 등도 중국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미츠비시케미칼은 2022년 중국에 컬러 레지스트 잉크 기술을 라이선스할 예정이다. TFT용 레지스트 분야는 중국의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며 독일 머크(Merck)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Chongqing CEMI는 충칭 쓰촨지구에서 현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살려 수요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윤화 선임기자: kyh@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