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EV용 필두로 개발 경쟁 … 글로벌 수요 연평균 30% 증가
CNT(Carbon Nano Tube)가 LiB(리튬이온전지) 시장에 이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NT, 그래핀(Graphene), 풀러렌(Fullerene) 등 나노카본 소재는 도전성과 열전도율 등을 살려 에너지 디바이스, 방열부품에 투입되고 있으며 가볍고 강도가 높아 복합소재 후보물질로도 고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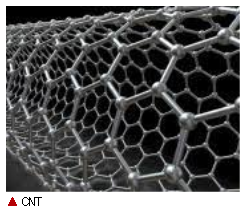 CNT는 직경이 나노미터 크기의 탄소로 구성된 튜브 형태 물질로 여러개의 튜브가 겹쳐진 다층 CNT와 흑연 시트 1장으로 이루어진 단층 CNT로 구분되고 있다. 단층·다층 모두 매우 가벼우면서 구리 대비 인장강도가 50배, 열전도율은 1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T는 직경이 나노미터 크기의 탄소로 구성된 튜브 형태 물질로 여러개의 튜브가 겹쳐진 다층 CNT와 흑연 시트 1장으로 이루어진 단층 CNT로 구분되고 있다. 단층·다층 모두 매우 가벼우면서 구리 대비 인장강도가 50배, 열전도율은 1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그물코처럼 6각형으로 결합돼 있는 시트 형태 소재로 1나노미터급 원자 1개 두께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뛰어난 도전성을 보유하고 있다.
카본 소재는 고기능성 뿐만 아니라 탄소가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으로도 뛰어난 소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량만 첨가해도 우수한 특성을 부여할 수 있어 모재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편이다.
CNT는 원래 경량과 강도가 주목을 받아 복합소재용 응용 연구가 먼저 추진됐으나 최근 도전성을 살린 LiB 양·음극재용 도전재용이 주류로 자리를 잡으면서 글로벌 LiB 강자인 중국이 점유율을 크게 확대했다.
글로벌 배터리 도전재용 CNT 시장은 2030년 약 3조원으로 성장하고, 전체 CNT 수요는 2022년 1만4000톤에서 2030년 9만5000톤으로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LG화학이 배터리 소재용 CN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최근 생산능력을 6100톤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CNT를 최초 발견한 일본은 화학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스타트업도 적극적으로 나노카본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 MI Tsukuba(Material Innovation Tsukuba)가 그래핀과 CNT 복합소재 Gmit 시장을 개척해 주목된다.
Gmit는 그래핀으로 CNT를 감싼 독특한 구조를 채용함으로써 그래핀의 재적층 문제를 방지했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여 그래핀 LiC(리튬이온커패시터)용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MI Tsukuba는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한 다음 LiC에 저장해 가로등에 탑재된 IoT 기기에 Gmit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InALA(Incubation Alliance)는 독자공법을 활용한 그래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촉매 및 기판을 사용하지 않고 고순도 그래핀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직접합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데카(ADEKA)는 2023년 4월 InARA 지분 78.3%를 인수해 자회사화했으며 양사의 기술을 융합해 방열소재와 배터리 소재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호쿠(Tohoku)대학은 카본 신소재 GMS(Graphene Meso Sponge)를 개발했다. 그래핀과 마찬가지로 두께가 탄소 1개 사이즈에 스펀지처럼 다공성 구조로 이루어진 소재로 기존 카본에 비해 화학적‧물리적 내구성이 우수하고 축전 및 발전 디바이스용 소재에 최적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Carbon Fly는 CNT 상용화를 목표로 Kanematsu, FCC와 공동으로 카본 리사이클 사업 검토에 착수했으며 화학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로 CNT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고품질 CNT 양산설비를 개발했으며 CNT 생성 뿐만 아니라 파우더, 섬유, 필름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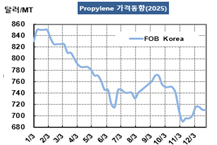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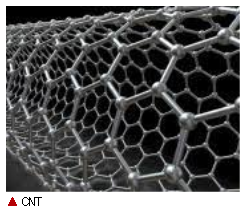 CNT는 직경이 나노미터 크기의 탄소로 구성된 튜브 형태 물질로 여러개의 튜브가 겹쳐진 다층 CNT와 흑연 시트 1장으로 이루어진 단층 CNT로 구분되고 있다. 단층·다층 모두 매우 가벼우면서 구리 대비 인장강도가 50배, 열전도율은 1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T는 직경이 나노미터 크기의 탄소로 구성된 튜브 형태 물질로 여러개의 튜브가 겹쳐진 다층 CNT와 흑연 시트 1장으로 이루어진 단층 CNT로 구분되고 있다. 단층·다층 모두 매우 가벼우면서 구리 대비 인장강도가 50배, 열전도율은 1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