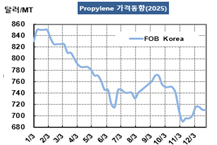미국, 20년만에 중국 수출액 역전 … 중간재, 중국산 수입 31%로 상승
한국은 최근 20년 동안 제1교역국 지위를 유지했던 중국과의 무역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중국 수출액이 1248억달러로 2022년 1558억달러보다 19.9% 급감해 40년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181억달러로 1992년 이후 첫 적자전환이자 역대 최대의 적자를 나타냈다.
중국 무역수지는 2018년 556억달러에서 2019년 290달러, 2020년 237달러로 지속 하락한 후 2021년 243억달러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2년 12억달러, 2023년 마이너스 181억달러로 격감했다.
2024년 1-5월 미국 수출액은 533억달러로 중국 526억9000만달러보다 6억1000만달러 가량 많았으며 20년 만에 중국 수출액을 앞질렀다.
국내 산업 수출입 구조는 최근 5년간 해외 중간재 공급이 축소됐으나 수입 중간재 의존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중간재는 비중이 2016년 27.3%에서 2023년 31.3%로 상승했으며 2017-2023년 2차전지 소재 관련 원자재 가공제품의 수입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산 전구체, 수산화리튬, 양극재·양극활물질은 수입이 2016년 1억-2억달러에서 2023년 25억-49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전체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78.4%로 2016년보다 5.5%포인트 상승했으나, 중국의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한국산 중간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중국 수출이 중간재 중에서도 석유화학, 2차전지 관련 원자재 가공제품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고위기술품목에 집중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와 자급률 제고의 영향을 받아 취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글로벌 무역에서의 역할이 외국산 중간재 단순 가공에서 자체 중간재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구조로 발전했으며 자급률 제고 및 기술 수준 향상으로 2016년 이후 한국산을 포함한 글로벌 중간재·최종재 수입 비중이 감소한 반면,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아프리카·중남미 자원 수입이 증가하면서 1차산품 수입을 확대됐다.
전체 수입제품 중 중간재 비중은 2023년 45.1%로 2016년에 비해 8.4%포인트 하락했으며 한국산 수입은 1차 산품, 중간재, 최종재 등 모든 가공 수준별 부문에서 성장세가 둔화했다.
전체 수출제품 중 중간재 비중은 2023년 45.8%로 3.7%포인트 상승했고 한국 수출제품 중 중간재 비중은 64.4%로 7.8%포인트 올랐다. 전체 중간재 수출은 1조5000억달러 수준으로 73% 증가했다.
수출에서는 중간재 제조 역량을 활용한 고부가 시장 진입으로 상위 및 중위 기술 중간재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나 한국에 대한 수출은 중간재 중에서도 원자재 가공품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국내 주요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중심의 해외 집중형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 주요기업의 글로벌 생산설비는 15-20%가 중국에 있어 절대적인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줄이면서 투자 회수를 통한 생산기지 다변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투자 회수액은 2021년 25억8000만달러, 2022년 11억7900만달러, 2023년 6억21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국 제재와 수출 통제 등을 고려하면 최종재로 주력 수출 상품을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현재 독과점하고 있는 원자재 가공·제련 기술을 국산화해 국내기업의 공급망 내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설비 건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