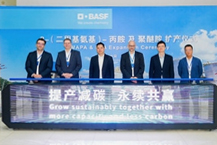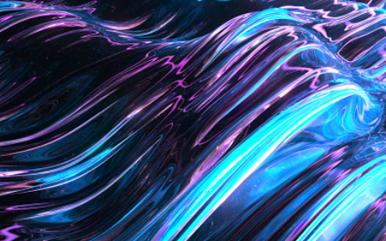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져 2050 넷제로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가운데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정유․석유화학기업들도 온실가스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처지여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국내에는 탄소를 저장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인근 바다에 저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으로 오스트레일리아나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해 해외 저장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해 유정․가스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장기적 활용이 어려워 해외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공간은 그런대로 확보할 수 있으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점이다. 포집 기술 개발도 일본이 한발 앞서나가고 있어 어쩌면 일본 기술을 라이선스해야 할 처지로 전락할지 우려된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해외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것이 별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나 꼭 그러하지는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전략적으로 라이선스를 거부할 수도 있고, 라이선스 비용이 막대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CCUS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까지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CCUS 신규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이산화탄소 포집용량 확보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4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 현재 가동하고 있는 CCUS 설비는 27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설은 5개, 개발 진행단계는 66개, 개발 초기 및 발표 단계는 97개로 집계됐다.
현재 세계 25개국이 운영 및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이 개발단계 프로젝트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매년 세계적으로 300만톤의 이산화탄소 포집용량이 추가돼 총 포집용량이 4000만톤에 도달했으나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6억톤의 포집용량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EA는 지난 10년간 CCUS 개발이 대체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수의 CCUS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고, 정책적 지원 역시 CCUS 투자를 위한 광범위한 프레임워크 구축보다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으로 한정 운용됐기 때문이다.
저장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없거나 CCUS 설비의 운영비 상승 요인이 프로젝트 취소 이유로 파악된다.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 지원을 늘릴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다만, CCUS 설비의 상업적 접근방식이 대규모 독립형에서 공유형 운송·저장 인프라를 갖춘 산업 허브 개발로 전환되면서 규모화되고 있고, 미국의 45Q 세액공제나 유럽의 탄소가격제 등 CCUS 지원 정책이 일회성 보조금에서 CCUS 투자를 위한 시장 창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상당히 희망적이다.
미국의 45Q 세액공제는 원유회수증진(Enhanced Oil Recovery) 기술에 활용되는 이산화탄소에 톤당 35달러, 저장된 이산화탄소에는 톤당 50달러까지 점진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기업들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장기적 대책은 아니더라도 CCUS 포집 기술 개발이나 해외 저장공간 확보에 있어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CCUS는 하나의 현상이나 일시적 바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