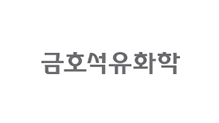삼성·SK·LG, 계열사 통해 개발·생산
삼성, SK, LG는 바이오제약 부문의 계열사들이 그룹의 핵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 임상2상을 마친 후 기존 약물보다 2배 이상 뛰어난 약효를 입증해 안전성만 테스트해도 된다는 FDA(미국식품의약국)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임상3상 없이 신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을 통해 미국시장에서 매출 1조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그룹은 신약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SK바이오팜, SK바이오텍과 백신 및 혈액제를 생산하는 SK케미칼, SK플라즈마가 바이오제약 부문의 양축을 맡고 있다.
기술 수출한 기면증 신약은 임상3상에 진입했고 급성발작 치료제는 FDA에 신약승인 신청을 마쳤으며 과민성대장증후군, 파킨슨병 치료제 등 FDA로부터 임상을 승인받은 신약 파이프라인은 모두 14건에 달한다.
최근 국내 최초의 세포배양 독감백신인 스카이셀플루를 출시했고 혈우병치료제의 FDA 신약 시판허가 신청도 마쳤다.
SK는 CMO(위탁생산) 전문기업인 SK바이오텍의 지분을 전량 인수해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격상시키고 증설 등을 위해 4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바이오제약 육성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바이오시밀러 개발기업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CMO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제약 부문을 이끌어가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글로벌 5대 바이오의약품 가운데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약인 엔브렐과 관절염 치료약 레미케이드를 복제한 브렌시스와 렌플렉시스를 잇따라 개발해 보건당국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류마티스 치료제 휴미라, 당뇨병 치료제 란투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경쟁체제를 갖추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세계 최대의 생산규모를 보유한 CMO로 도약할 채비에 나섰다.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3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떴으며 8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3공장까지 모두 가동하면 생산능력이 36만리터까지 확대돼 세계 1위의 바이오의약품 CMO로 도약하게 된다.
LG의 바이오제약 계열사인 LG생명과학은 당뇨병 신약인 제미글로를 필두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골관절염 신약인 시노비안의 2번째 임상3상을 2016년 3월 성공적으로 마쳤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한 5가 혼합백신(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간염, 뇌수막염) 유펜타의 사전적격승인도 획득해 4000억원 가량의 국제 구호 입찰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생명과학은 백신 사업을 대폭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16년 안에 6가 혼합백신 및 폐렴백신 등 글로벌 시장 입찰용 백신의 임상시험에 돌입하고 개량형 혼합백신, 신규 폐렴백신 등 프리미엄 시장용 백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위탁사업, 의약품에서 재생의료까지…
항암제는 임상시험에 관한 위탁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제약기업들은 분자표적 치료약 및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 유전자 치료 등 신약을 개발해 경쟁기업보다 먼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암의 종류가 다양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테스트 횟수가 늘고 개발체제가 다양해지고 있어 CRO(임상시험수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항암제 관련 분야가 위탁사업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계 Quin Tiles Transnational Japan은 종양학 분야를 개발하는 전문 유닛을 확충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위탁 실적이 있는 일본 Clio-Science도 인수했다.
Cmic Holdings은 해당 분야의 의료 개발업무를 실시하는 Shift Zero와 합작기업을 설립해 항암제 개발 및 생산 영업·마케팅 등의 지원체제를 일제히 강화하고 있다.
EPS는 SMO(임상설비 지원기관) 사업의 경쟁기업이었던 Sogo Rinsho Holdings을 인수해 일본 최대규모인 SMO 리소스와 CRO 사업간의 시너지를 발휘하며 암 분야의 설비를 강화하고 있다.
위탁 사업은 의약품 이외에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Quin Tiles은 기존 의약품용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의 통괄 부문을 설립했으며 Kobe Portisland의 의료 도시에도 약사 컨설팅 업무를 시행하는 신규거점 「Quin Tiles 첨단의료임상개발 오피스」를 신설했다.
Cmic도 재생의료에 특화한 컨설팅 팀을 신설했다.
재생의료 시장은 아직 시작단계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개발 지원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약사규제의 변화는 새로운 니즈를 창출하고 있다.
일본에서 2013년 이후부터 승인 신청된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개발에서 시장 투입 이후까지 리스크 관리 계획을 하나의 문서로 정리함으로써 시판 후에도 정기적으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약품 리스크 관리계획(RMP)」 책정이 의무화됐다.
2017년부터는 해외에서 도입이 시작된 세계 표준의 임상시험 데이터 교환 규격 CDISC 표준을 바탕으로 전자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으로 제약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시험의 모니터링 업무를 효율화하는 새로운 모니터링 방법인 「리스크를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RBM)」도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해외 및 일본 메이저들은 유럽·미국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곳도 있으나 CRO 전문기업들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제약기업보다 앞서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재빨리 자사의 위탁 서비스에 반영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해당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다.
CMO,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의존 탈피
일본에서 주로 생산·포장 공정을 위탁하는 CMO 비즈니스 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2005년 구 약사법 개정 이후로 역사가 길지 않으나, 신약 생산기업의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을 중심으로 위탁사업이 확대됐다.
신약 생산기업들은 대부분 공장을 인수 혹은 매수해 CMO 사업을 시작했으며 일본 최대 메이저인 Nipro Pharma는 Daiichi Sankyo 및 Chugai Pharmaceutical의 공장 등이 전신이다.
Bushu Pharmaceutical은 Sandoz 및 Shionogi 공장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4년 Eisai의 Misato 공장을 인수해 의약품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했다.
CRO 전문기업인 Cmic은 SSP, Daiichi Sankyo, Mitsubishi Tanabe Pharma 등의 공장 및 외국기업을 잇따라 인수해 사업을 본격화했다.
CMO 전문기업들은 신약 생산기업들이 사업 효율화의 일환으로 생산을 중단한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수익성이 떨어진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등의 생산설비를 구축해 위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했으나 제네릭 시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사업전략의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축소되고 약가 인하에 따른 제조코스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위탁 생산을 실시하고 있는 신약·제네릭 생산기업도 적지 않다.
한편, 의약품 시장 점유율 80%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제네릭 관련기업들은 증설투자를 서두르고 있으며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을 생산해 온 CMO 공장을 활용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몇년 전까지 대폭적인 약가 인하가 없고 제네릭의 시장 침투가 완만했던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을 중점 생산해온 공장이 가격인하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제네릭을 생산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해외 CMO가 존재감을 키워나가면 시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형 CMO는 일반적인 고형제제를 위탁 생산할 뿐만 아니라 해외 및 고부가가치 분야의 활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Nipro Pharma는 베트남에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내수용으로 주사제의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주사제를 풀생산할 수 있는 일본기업이 한정적인 가운데 Nipro는 코스트 경쟁력도 향상시켜 주사제 위탁생산 점유율을 확대하고 일본 외 국가에도 수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베트남에서 경구제 및 외용제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Odate 공장에서는 항암제 및 호르몬제, 바이오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등 타사가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사업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Cmic도 바이오의약품 및 고활성물질 등 고부가가치제품 분야에 대응하고 있다.
JSR과 「Cmic JSR Biologics」를 설립해 Tokyo대학, Tohoku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다종 특이성 항체 시즈를 활용한 Bio Specific 항체 등의 설계·제조 프로세스 개발에 돌입했다.
Mitsubishi Tanabe Pharma로부터 인수한 Ashikaga 공장을 통해 주사제의 위탁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내 3곳에서 주사제, 고형제, 반고형제 전체의 고약리활성물질 생산에 대응할 계획이다.
Shizuoka 공장에 개발센터를 설립해 제제 처방 설계에서 임상제조, 생산까지 위탁할 수 있는 CDMO(의약품개발제조지원)로서도 존재감을 높여갈 방침이다.
초대형 신약 등장으로 시장 급변
최근 신약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C형간염(HCV)의 경구 치료약이다.
그동안 고령자 등에게 투여하기 어려웠던 IFN(Interferon) 제제를 사용한 치료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5년부터 IFN이 들어가지 않은 경구제를 통한 치료가 일본에서 가능해졌다.
제약기업들이 경구제 개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세계적인 초대형신약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Gilead Sciences의 Sovaldi, Harvoni이다.
Gilead Sciences는 일본에서 2015년 5월 유전자형 2형인 Sovaldi를 HCV 치료약으로, 9월에는 Harvoni를 유전자형 1형 치료약으로 출시했다.
Sovaldi와 Harvoni는 IFN을 처방받을 수 없는 환자도 하루 1회 1정씩 약 3개월 동안 복용하면 100%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획기적인 신약이다.
Sovaldi는 2015년 일본 매출액이 1176억엔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Harvoni는 1116억엔으로 4위를 차지해 발매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초대형 신약으로 성장했다.
HCV 경구제는 Bristol-Myers Squibb(BMS)도 유전자형 1형인 Sunvepra와 Daklinza, AbbVie도 Viekirax를 발매했다.
MSD도 경구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제약기업들은 기타 유전자형에 대응한 배합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의료 관련부처는 경구제의 등장으로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는 HCV 치료약에 개입했다.
Sovaldi의 약가는 1정당 약 6만1800엔, Harvoni는 8만1700엔으로 12주간 1크루 치료하는데 각각 520만엔, 673만엔 가량의 치료비가 들며 의료비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액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판매액이 큰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시장 확대 재산정」을 도입했으며 2016년 4월 약가 개정에서 Sovaldi, Harvoni 모두 31.7% 가량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HCV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격변하고 있는 분야는 암 치료에 사용되는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 등 종양면역 치료요법이다.
면역요법은 수수, 항암제, 방사선에 이은 「제4의 치료법」으로서 실용화가 기대되고 있다.
환자에게서 채취한 면역세포를 사용하는 면역세포요법, 암 항원을 활용한 백신요법 등의 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Ono Pharmaceutical과 미국 Bristol-Myers Squibb이 개발한 항 PD-1항체 Opdivo, BMS의 항CTLA-4 항체 Yervoy 등의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가 제약기업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하도록 하는 「면역기능 브레이크」를 해제함으로써 면역기능을 정상화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요법이다.
항암제 시장은 폐암 분야를 중심으로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의 존재감이 더욱 커져 10년 후에는 약 50% 가량의 암 치료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나 기자: lhn@cheml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