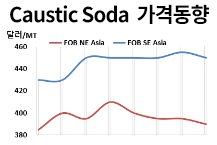국내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글로벌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시장은 당초 2024년경 공급부족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완성차기업들이 2020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섬으로써 이르면 2021년, 늦어도 2022년에는 수급이 급격히 타이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일부 완성차기업이 배터리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내기업 중에도 LG화학이 재규어(Jaguar)에게 배터리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재규어가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정부 보조금을 통해 급성장해온 중국 배터리 생산기업들은 2022년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세우고 있는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공급량 감소가 유력해지고 있다.
또 중국기업들이 아직 유럽‧미국 완성차기업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출 수 없다는 점에서도 수급타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배터리 생산기업들은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완성차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잇따라 설립하고 있다.
LG화학은 중국 지리자동차(Geely Auto), 미국 GM(제너럴모터스)과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합작법인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의 합작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 베이징자동차(BAIC)와의 합작공장을 추진해 2019년 12월 완공했다. 한때 폭스바겐(Volkwagen)과의 합작기업 설립설이 제기됐으나, 폭스바겐이 스웨덴 노스볼트(Northvolt)와 합작하기로 해 무산됐다.
폭스바겐은 2020년 5월 중국 4위 배터리 생신기업인 Guoxuan High-Tech의 지분 26.5%를 인수한다고 밝혔고, 다임러(Daimler)도 중국 Farasis와 배터리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등 최근에는 유럽 자동차기업들의 합작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물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배터리가 기술 집약적이라는 특성상 긴밀한 협력 없이는 양질의 생산제품을 완성하기 어렵고 공급계약만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배터리 생산기업도 공장 건설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자동차기업과의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합작기업 설립으로 기술유출 우려가 생겨 추가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합작법인 설립 열풍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LG화학은 구미 양극재 공장을 중국기업과 합작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 중국 화유코발트(Huayou Cobalt)와 합작기업을 설립해 전구체, 양극재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삼성SDI도 2020년 2월 에코프로비엠과 양극재 합작법인 에코프로이엠을 설립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