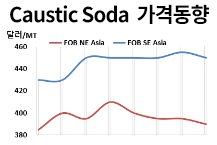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5년만에 화학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평법·화관법 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5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113건에서 2017년 79건, 2018년 66건, 2019년 57건으로 법 시행 이후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화학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생한 화학사고 원인 물질은 염산(염화수소), 암모니아(Ammonia)로 각각 11%(59건)를 차지했다.
2018년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5년에는 여수 해양조선소의 암모니아 누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염산과 암모니아 다음으로는 질산 48건, 황산 40건, 톨루엔(Toluene) 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사고 원인 물질 가운데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현재 97종이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40종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2017년 이후 새롭게 추가한 사고대비물질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물질에 대한 검토와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화학사고가 감소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덕분으로 파악된다.
법 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사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으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제단체들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환경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환경부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 등을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환경단체와의 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