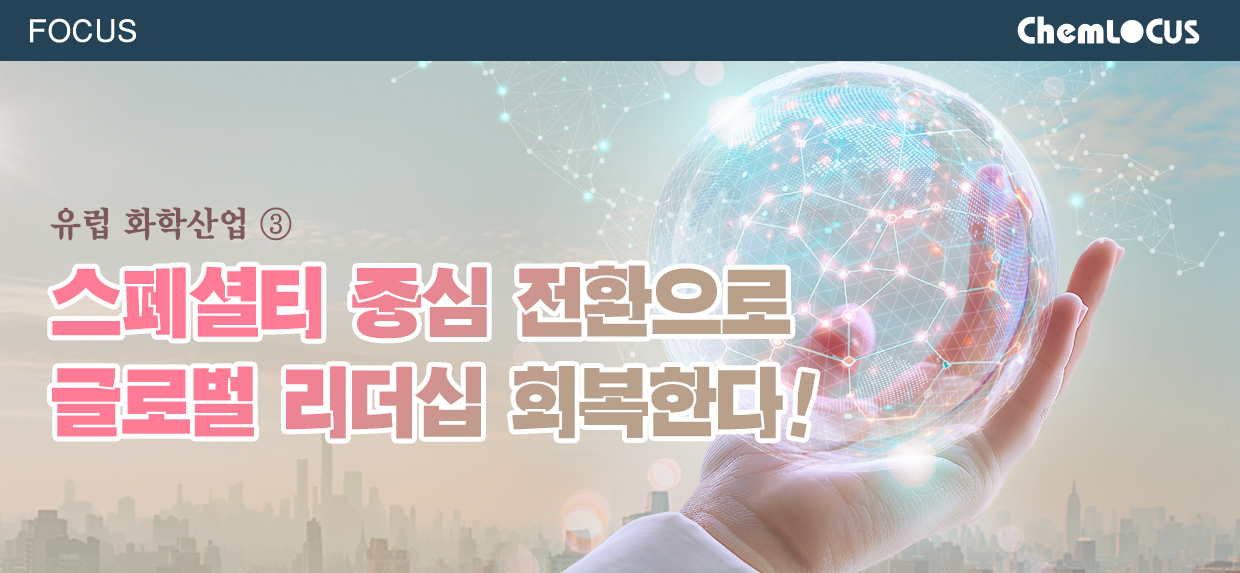플래스틱 리사이클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이 불면서 국내 화학기업들이 폐플래스틱 재활용과 ESG를 연결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학기업들이 홍보하는 플래스틱 리사이클이 진정한 의미에서 친환경 경영을 뜻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유럽 선진국들과 일본이 플래스틱 리사이클을 강조하며 친환경 경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때도 외면하더니 2021년 들어 갑자기 리사이클과 재활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플래스틱 리사이클은 이미 대세로, 포장을 중심으로 섬유 등 플래스틱 가공 관련기업들은 리사이클을 외면하고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박감에서 리사이클 압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리사이클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특히, 플래스틱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머를 대량 생산하는 석유화학기업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유럽, 일본에서는 폐플래스틱을 회수한 후 분해해 원료로 재사용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회수, 선별, 분해,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도… 롯데케미칼, SK종합화학 등이 플래스틱 가공기업들과 협력해 리사이클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LG생활건강, 롯데알미늄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PCR(Post Consumer Recycled) PET필름을 개발해 생활용품, 식품 포장에 적용했고 산업용까지 확대해 친환경 포장 흐름을 주도함으로써 ESG 경영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것은 한발 전진했으나 결코 의심을 지울 수는 없다.
SK케미칼이 폐 PET를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을 보유한 중국기업 슈에(Shuye)에게 230억원을 투자해 지분 10%를 취득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CR(Chemical Recycle) 기술을 적용해 재활용한 PETG를 상업화하겠다는 것은 이른 면이 없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리사이클이나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CR은 폐플래스틱을 분해해 폴리머 상태로 되돌린 다음 다시 플래스틱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리사이클의 궁극적 목표이다.
하지만, 국내 화학기업들이 내세우는 리사이클은 시늉만 재활용일 뿐 CR과는 거리가 멀다. CR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플래스틱 회수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머지않아 폐플래스틱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해외에서 폐플래스틱을 수입해 라시아클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지 않을지 걱정이다.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고 한다. 1980년대 말 환경운동가 제이 웨스트밸드가 피지섬에 갔다가 섬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호텔의 객실에 환경보호를 위해 타월을 재사용해달라는 안내문을 보고 만들어냈다고 한다.
국내 화학기업들이 친환경 이미지 캠페인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고 금융권과 어울려 녹색채권 발행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환경친화적이라는 홍보와 다르게 효과를 과장하거나 아예 거짓으로 이미지를 각색하는 우려가 늘어나면서 그린워싱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
블룸버그가 2021년 들어 국내기업들이 발행한 녹색채권이 105억달러로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2위이지만 녹색채권을 발행한 한국기업 대부분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굴뚝산업에 속한다고 비꼬았다고 한다.
EU가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고 판별하는 분류체계인 택소노미 초안을 마련하고 머지않아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린워싱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