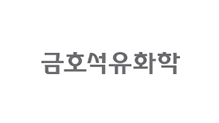화석연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78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으나 9월28일에는 브렌트유(Brent)가 80달러까지 치솟아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형성했고 두바이유와 WTI도 75달러를 넘어섬으로써 1년 사이에 100% 수준 폭등했다. 석탄 가격은 2020년에 비해 3배 수준으로 폭등했고, 천연가스도 미국 기준으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형성했다.
중국에 이어 미국‧유럽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투기자금까지 몰려 화석연료 가격 폭등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OPEC+가 증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이 허리케인 아이다(Ida)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의 중심을 이동하면서 원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석탄 가격이 치솟았음은 물론 석탄 공급부족으로 일부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해 산업생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전력난으로 갑작스러운 단전이 잇따르고 있고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 제련을 비롯해 철강, 화학공장 일부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공장 중 스팀 크래커는 정상 가동하고 있으나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전해 설비와 폴리에스터를 중심으로 한 합성섬유 공장은 가동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의 전력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불분명하나 10월 초 국경절 행사가 겹쳐 최소 10월 중순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석탄 공급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력난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석탄화학을 중심으로 화학공장 가동 차질로 이어져 아시아 석유화학 시장에 또다른 회오리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MEG는 물론이고 에틸렌, 프로필렌, PE, PP, PVC 등 석유화학 전반에 생산 차질의 후폭풍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다운스트림 가동중단으로 이어지면 석유화학 시장 자체가 붕괴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전력난은 오스트레일리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탈탄소화를 급격히 추진하면서 이미 예견된 사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후 미국·유럽 등 다수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자 중국도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국제협조가 진일보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나 중국 자체적으로는 대책이 없는 실패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며 1980-2020년 기간에 1차 에너지 소비량이 8.3배 폭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6.7배 늘어 글로벌 배출 비중이 7.9%에서 30.7%로 급상승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은 발전 46.9%, 제조 35.6%로 전력난이나 제조강국 지위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와 중공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탈피해야 하나 에너지 기술 개발, 산업구조 조정,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 등 청정에너지 전환, 전기화가 쉽지 않고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활용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중국의 전력난이 가져올 후폭풍을 예의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