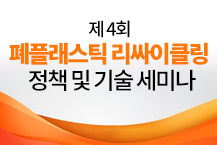2021년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를 불러왔던 대형 부동산 개발기업 헝다(恒大)가 미국 뉴욕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한다.
헝다는 미국 뉴욕법원에 챕터 15(연방파산법 제15장)를 신청했다. 챕터 15는 외국계가 회생을 추진할 때 미국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요구와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으로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2021년 헝다에 이어 2023년 7월 완다(萬達), 8월 초 비구이위안(碧桂園), 위안양(遠洋) 등 대형 부동산 개발기업들이 채무 상환에 실패하며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고, 부동산 개발기업의 디폴트에 따라 중룽(中融)국제신탁이 9000만위안(약 165억원) 상당의 투자상품 상환에 실패하는 등 부동산 버블의 파장이 중국 경제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불투명하고 부도 가능성이 큰 그림자 금융 형태로 이루어져 오래전부터 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2011년 6011억달러(약 807조원)에서 2021년 11조4209억달러(약 1경5300조원)로 2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8월16일 51조원의 유동성을 단기금융시장에 투입하는 한편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식 순매도 금지령을 내리며 시장 불안 차단에 나섰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개발 메이저에 이어 중견기업으로 디폴트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가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고 홍콩을 강제 병합해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이어 타이완을 강제 병합할 수 있다는 강경책을 들고나옴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반발을 사 수출이 타격을 입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활성화에 나섰으나 실패한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더군다나 남중국해를 일방적으로 점령하고 군사 기지화함으로써 동남아 국가들로부터도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유럽기업들의 탈중국화가 줄을 잇고 있고 동남아에 이어 인디아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이다.
문제는 국내기업에 미치는 파장이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25%를 넘나드는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가운데 중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짐으로써 중국 수출 정상화를 통해 수출 부진을 극복하려는 전략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기대를 밑돌고 있음은 물론 부동산 불황에 따라 건설·건축용 화학제품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단면이다. 일부에서는 2023년 하반기부터 중국 수출이 살아나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물거품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 카드로 타개를 노릴 것인가?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생산량의 60%를 장악하며 절대적인 패권을 확보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채굴·분리·금속화 등 영구자석 통합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희토류 무기화에 성공했고 일본에 이어 서방 전체의 굴복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공급 차질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 완화 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적 비축량 확대, 오스트레일리아 중심의 동맹국 대체 공급량 확보, 희토류에 대한 중국산 의존도 축소, 희토류 채굴·가공·다운스트림까지 생태계 복원에 힘씀으로써 빛을 잃어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신증설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산 수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을 흔드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에 이어 반도체, 전자제품, 스마트폰 등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카드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내 화학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로 만반의 대비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