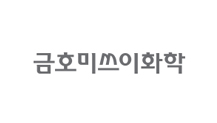일본, COP에 세라믹계 필러 10% 조합 … 유전률‧유전정접 향상
일본이 차세대 이동통신용 저유전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수지 스크리닝, 세라믹계 필러 배합을 통해 비유전률 및 유전정접 저감을 실현했고 세라믹계 필러를 10% 배합한 COP(Cyclo Olefin Polymer)로 300GHz대 6G 보급과 함께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유전률 2.0 이하, 유전정접 0.0025 이하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메커니즘 상세 규명을 진행하며 배선 소재의 밀착성 향상, 기판 양산 프로세스 확립 등 관련 개발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6G는 2030년 보급이 기대되는 5G 후속 무선통신 시스템으로 주파수 대역 100-300GHz를 사용하며 5G보다 우수한 고속대용량 및 고신뢰 저지연 특성을 갖추고 평방미터당 1억개에 달하는 기기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 초스마트 사회 5.0을 실현하는 통신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2020년 6G 실현을 위한 세라믹 기기 사양 로드맵을 정하고 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고주파 회로 중 안테나, 필터 등 수동부품이나 고속 디지털 등 전송회로와 같은 100GHz 이상 고주파 전기신호를 취급하는 부품을 대상으로 비유전률, 유전정접 등 핵심 특성 뿐만 아니라 주파수 특성, 온도의존성, 열팽창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5G용 유전체용으로 현재 불소수지를 베이스로 한 저유전 소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5G용 소재를 개량하는 것만으로는 유전정접 및 비유전률 저감에 한계가 있어 6G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이 PFAS(Polyfluoroalkyl Substance) 규제를 추진하며 불소계 소재와 동등한 물성을 갖춘 대체소재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기존 가설에 따라 저유전화에 도움이 되는 수지 다공질화를 시험한 결과 유전률보다 유전정접이 더 크게 낮아지는 문제를 발견했다.
대기 중 미량의 수분이 흡착되며 발생한 문제로 추정하고 불소계와 동등한 저유전성, 수지 중에서 최소수준의 흡수성을 가진 COP에 세라믹계 필러를 배합해 해결했으며 앞으로 고주파체에서 비유전률, 유전정접과의 관계성이나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실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COP 실용화에 성공한다면 모바일 기기나 자동차용 FPC(플렉서블 프린트 기판) 분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FPC는 현재 저유전 수지 필름과 동박 등 배선 소재를 조합해 제조하나 6G 시대에는 도전률 향상을 목적으로 동박 평탄화가 진행되며 저유전 수지 필름과의 밀착성이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OP 수요 발생을 확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합성방식을 개량함으로써 밀착성이 높은 소재 구조를 창출하고 초임계 발포 대응 압출기와 필름 시험제작기를 활용해 동박과 부착하는 프로세스를 완성할 계획이다.
6G를 중심으로 한 고속통신 인프라는 고속‧대용량 통신 뿐만 아니라 5G의 100배 수준으로 동시접속을 실현함으로써 고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기여하고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고속통신 인프라는 통신사부터 기기 생산기업, 부품‧소재 등 서플라이체인 전반에서 개발을 진행해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로드맵을 통해 공동 연구를 가속화하고 통신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프린트 기판 회로 등은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높아지면 통신 경로 거리에 따라 전기신호 감퇴를 의미하는 전송손실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유전손실은 전송손실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로 유전정접과 유전률 값의 차이가 커지는 만큼 손실도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유전률은 유전체에 전장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전하 관계를 의미하는 계수이며, 유전정접은 유전체 내부 발열에 따른 전기에너지 손실 정도를 가리킨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