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시장 2035년 19조원대 … 일본, 전극 소재 개발에서 선두
NiB(나트륨이온전지)가 포스트 LiB(리튬이온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NiB는 지구상에 풍부한 나트륨을 원료로 사용하며 에너지밀도가 낮음에도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저온에서 성능 저하가 심하지 않은 장점이 있어 2021년 중국 CATL이 차세대 배터리로 개발·생산에 나선 이래 상용화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파라디온(Faradion), 스웨덴 알트리스(Altris), 프랑스 티아마트(Tiamat), 미국 나트론에너지(Natron Energy)가 NiB 양산 계획을 공개했고, 국내에서는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복합 고체 전해질 및 2차전지 특허를 양수한 에너지11이 유일하게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본격 양산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륜차, 소형 전기자동차(EV),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 투입되면서 2035년 글로벌 수요가 최대 254.5GWh, 시장은 142억달러(약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배터리 생산기업들의 선제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2025년 본격 양산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륜차, 소형 전기자동차(EV),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 투입되면서 2035년 글로벌 수요가 최대 254.5GWh, 시장은 142억달러(약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배터리 생산기업들의 선제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산학연계를 바탕으로 NiB 소재 신기술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어 국내 배터리 3사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NiB는 원래 일본 규슈(Kyushu)대와 도쿄(Tokyo)이과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혁신 배터리로 일본대학들이 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확보하고 있다.
주석, 인, 안티몬 등 합금화 반응 소재가 개발되면서 나트륨 흡수‧저장량이 상당수준 늘었으나 충‧방전 시 체적 변화가 커 안정적 성능을 얻을 수 없는 한계로 화합물을 통한 음극재 개선 기술 개발이 주목되고 있다.
개발 초기에는 탄소계 음극재 연구가 주류였고 산화물계는 소수였으나 최근 산화물계 연구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도다(Toda Kogyo)와 돗토리(Tottori)대가 공동 개발한 나트륨 페라이트(Ferrite)를 활용하는 산화물계 음극재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다는 기존에 이산화탄소(CO2) 포집 소재로 개발하던 나트륨 페라이트를 NiB 음극재로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으며 양극, 음극에 모두 적용했을 때 충‧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LiB는 양극에 코발트, 니켈 등 고가의 금속을 사용해야 해 코스트 부담이 큰 반면, 산화철에 아연 등 금속 첨가물을 혼합한 페라이트는 자원 고갈 부담이 적고 저가라는 특징이 있다.
돗토리대 연구팀은 과거 루타일(Rutile)형 이산화티타늄(TiO2: Titanium Dioxide)을 NiB 음극재로 주목했으나 이산화티타늄은 전자 전도성이 낮아 나트륨 이동경로 방향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후 단결정화, 불순물 도핑 기술을 강화해 세계 최초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을 NiB 음극에 적용한 후 실제 작동까지 성공함으로써 상당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나트륨 페라이트 적용에도 관련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NiB 음극재에 산화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정구조 사이에 나트륨 이온을 끼워넣은 삽입정렬 반응 소재가 필요하며, 돗토리대가 이산화티타늄을 주목한 것도 삽입정렬을 위한 것으로 나트륨 흡수‧저장량이 많지는 않으나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화철은 나트륨 흡수‧저장과 함께 상분리돼 구조가 크게 변함으로써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며 돗토리대-도다 공동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서는 산화철 입자 미세화와 합금화 반응을 나타내는 주석 복합화로 성능 개선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돗토리대 연구팀은 앞으로 빛을 조사할 때 나트륨을 흡착하고 충전 반응을 시작하는 광전기화학 커패시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태양전지와 배터리를 조합한 형태로 이산화티타늄이 광전변환을 실시하면 산화망간이 나트륨을 흡착해 광충전 및 광방전 반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한 이후 세운 연구 계획으로 알려졌다.
광전기화학 커패시터를 상용화하면 사막이나 도서지역 등 발전소가 없는 곳에서도 통신기기나 휴대용 장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엽록소 등 식물 광합성 관련 물질과 이산화티타늄을 조합해 새로운 광충전 기능을 확립할 수 있을지 규명하고 있어 도다 등 화학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윤화 책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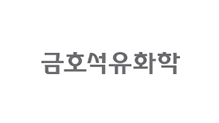












 2025년 본격 양산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륜차, 소형 전기자동차(EV),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 투입되면서 2035년 글로벌 수요가 최대 254.5GWh, 시장은 142억달러(약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배터리 생산기업들의 선제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2025년 본격 양산단계에 들어서면서 이륜차, 소형 전기자동차(EV),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 투입되면서 2035년 글로벌 수요가 최대 254.5GWh, 시장은 142억달러(약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배터리 생산기업들의 선제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