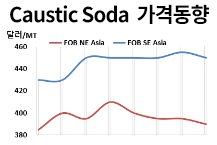국내 화학기업들이 고전에 고전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일본 화학기업들은 전반적인 공급과잉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일본 화학 메이저들은 2-3사를 제외하고는 2024년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도 흑자를 올림은 물론 몇몇은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화학기업들이 공급과잉의 덫에 걸려 적자를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무엇 때문일까?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화학기업들은 20-30년 전부터 범용 화학제품 생산능력을 줄이고 자동차, 전자, 반도체, 통신, 배터리 소재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화‧차별화를 강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개선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도 중국 부상 이전에 한국이 대두되자 범용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줄이면서 일부는 중국‧동남아시아로 이전하고 일부는 설비를 폐쇄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구조조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합병 또는 통합을 통해 생산능력을 줄이고 생산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국내 화학기업들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중국 신증설로 고전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대규모 신증설에 따른 공급과잉과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적자가 쌓여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중국 수요를 기대하며 신증설 경쟁을 벌인 결과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스트 경쟁력이 뛰어난 중동이 폴리올레핀을 중심으로 중국 공략에 그치지 않고 COTC(Crude Oil to Chemical) 기술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대두되고 있다. 에쓰오일이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샤힌 프로젝트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그치지 않고 에틸렌, PVC에 이어 PE 생산을 확대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사면초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밀화학도 마찬가지이다.
정밀화학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를 강화하고 기술 장벽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나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무기화학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정밀화학까지 집어삼키겠다고 나선다면 살아날 방도가 없는 상태이다.
선진국은 전체 화학공업에서 정밀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50%, 독일 70%, 스위스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전체 화학산업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학산업 역사가 길고 의약‧농약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염료‧안료, 계면활성제 등은 M&A를 통해 사업구조를 재편하거나 철수했다.
그러나 국내 정밀화학은 KCC를 비롯한 몇몇 대‧중견기업을 제외하면 중소‧군소기업이 주류여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시기를 놓쳤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하나 주먹구구식 경영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산업에 필요한 고부가‧차별화 소재를 일부 개발하고 있으나 역부족이고, 바이오‧생명과학 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석유화학이나 정밀화학 모두 구조정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첨단 기술 개발이나 친환경‧탈탄소 시장 개척,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개발도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화학산업은 일본을 따라잡기에도 뒤처져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비전 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