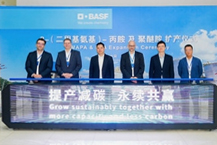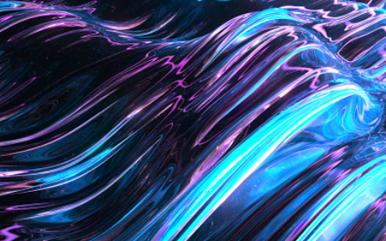국내 화학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체적으로도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높고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류,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핵심 광물 33종은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2020년 12.7%에서 2023년 21.6%로 상승했고 수입액도 33억달러에서 93억달러로 급증했다.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은 2018년 49.5%에서 2023년 61.2%로 상승했고 흑연(79.3%), 리튬(59.3%), 실리콘(50.0%), 텅스텐(68.7%), 바나듐(78.1%), 마그네슘(80.5%), 안티모니(73.3%), 비스무트(67.3%)도 중국에 절대 의존히고 있다.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는 갈륨(75%), 텅스텐(62%), 안티몬(63%)은 중국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화학제품도 중국산 의존도가 높지는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는 의약품·농약·화장품 원제·원료·중간체를 중심으로 라이프사이언스가 중국산 수입을 주도했으나 2000년 이후 무기화학제품도 국내 생산이 막을 내리면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석유화학제품, 배터리 소재, 전자·반도체 소재까지 국내 주력 산업이 중국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다.
석유화학은 2010년 기준 중국 수출 의존도가 48%에 달했고 일부는 5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할 정도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다. P-X는 2018년 국내 생산량의 61.8%를 중국으로 수출했고, 중국의 P-X 수입량 중 한국산 비중이 41.4%로 압도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신증설을 확대하고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서 중국산 석유화학제품이 역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이 자급률 100%를 달성하고도 신증설 작업을 멈추지 않아 앞으로 중국산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그치지 않고 첨단소재까지 중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터리 소재는 중국산 의존도가 이미 80%를 넘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것처럼 화학산업 관련제품 수출 규제에 나선다면 어떠한 풍경이 벌어질지 앞날이 훤하게 그려지는 이유이다. 중국은 미국이 압박을 강화하자 희토류를 무기화할 뜻을 숨기지 않았고 실제 자동차, 전자,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도 정면대결하는 마당에 한국쯤이야…
하지만, 국내 화학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수입하지 않으면 가동률을 낮추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중국이 수출을 중단하면 주력 산업이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정도이다. 일부에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화학제품을 고부가가치화·차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서둘러야 함에도 진전이 없다. 심지어 연구원들은 골프 치기에 바쁘고 퇴근하기가 무섭게 음식점으로, 술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역시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화학제품은 모든 산업에 있어 필수적인 중간소재로 중국에 예속당할 수는 없고 국산화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중국이 칼을 빼 들면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