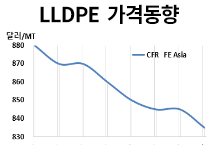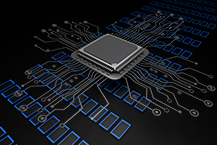일본이 인공광합성 기술 실증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CO2)에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인공광합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필드 실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양에너지를 사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광촉매 패널을 실험실 스케일의 100배에 해당하는 100평방미터로 확대하고 실제 환경에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최종연도인 2021년에는 에너지 변환효율 1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효율화와 함께 대면적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인공광합성 프로젝트는 △태양에너지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광촉매 △수소를 추출하는 분리막 △수소와 CO2를 원료로 올레핀을 제조하는 합성촉매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경제산업성이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로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2014년 이후에는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추진하고 있다.
미츠비시케미칼(Mitsubishi Chemical)과 미쓰이케미칼(Mitsui Chemicals) 등 관련기업 5사와 단체 1곳으로 구성된 기술연구조합과 대학, 국립연구기관의 산관학 연계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태양에너지로 물을 분리하는 광촉매 패널을 실증 실험할 계획이다.
실용화를 위해서는 고효율화와 함께 대면적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의 25cm급 유닛을 16개 연결해 1평방미터 사이즈로 개발하고 있으나 필드 실증에서는 100평방미터급으로 스케일을 확대하기로 했다.
설비 건설을 위해 예산을 2019년 14억엔에서 2020년 18억엔으로 늘리도록 요청한 상태이다.
효율화를 위해서는 2018년 수소와 산소를 서로 다른 광촉매로 생성하는 탠덤(Tandem) 셀형 광촉매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에너지 변환효율 5.5%를 실현한 바 있다.
앞으로 광전극 고기능화와 수분해용 탠덤셀 구조 최적화를 추진함으로써 2021년 말까지 10%를 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80%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위해 인공광합성 기술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인공광합성 기술을 적용해 화학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CO2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O2를 탄소화합물로 고정시킴으로써 대기 중의 CO2 감축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필드 실증 후에도 실용화까지는 수차례의 스케일 업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0년 책정할 예정인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에 사회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