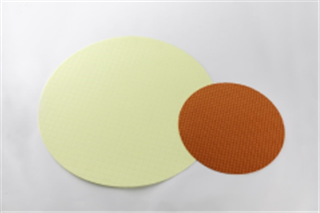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느니, 블루수소 확보에 나서겠다느니, 중동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소를 생산한 후 암모니아로 전환해 국내에 도입하겠다느니 등등 수소 프로젝트를 쏟아낸 것이 엊그제 같으나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춘 후 소식이 없다.
어디 수소에 그치겠는가? 탄소중립에 어떻게 대응하고, ESG가 어떠하며, RE100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등 친환경 경영을 소리높이 외쳤으나 어느 것 하나 진전되는 것이 없다. 아마도 한국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현실일 것이다.
LG화학이 대산에 수소 5만톤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이다.
LG그룹은 화학 사업이 주축으로 수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구광모 회장이 부정적이어서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판에 NCC에서 부생하는 메탄가스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로 바꾼 다음 다시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고 한다.
2025년까지 NCC 공정에 수소를 사용하는 등 청정연료 투입비중을 최대 70%로 확대함은 물론 바이오 원료 생산에도 수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수소는 석유화학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절대적이어서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도 수소 생산‧수송‧활용 기술 개발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 눈치만 보다가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청정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하고 수소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코스트 절감과 함께 다양한 산업의 수소 이용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글로벌 수소 생산량은 9000만톤으로 모두 석유정제 및 산업부문에서 공급했으나 대부분 화석연료 베이스로 약 9억톤의 탄소배출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기 베이스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해조는 글로벌 생산능력이 5년간 2배 확대돼 2021년 중반 300MW에 달했으나 턱없고, 2030년까지 35GW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40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
IEA는 전해조 프로젝트가 모두 실현되면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공급이 2030년 800만톤에 도달하나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요한 8000만톤에는 크게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해조 베이스 수소 생산능력은 유럽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남미·중동·중국·미국을 중심으로 생산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하는 수소 프로젝트는 16건에 70만톤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80% 정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생에너지 베이스 수소를 활용한 암모니아 제조 프로젝트는 2022년 말 스페인에서 시작하고 시멘트, 세라믹, 유리 공정에서 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실증 프로젝트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유‧석유화학은 물론 제철‧시멘트‧세라믹이 먼 산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2050년 넷제로 달성에 필요한 수소 투자액이 1조2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무엇인가 먹을거리가 풍부하다는 말로 들린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정부가 무엇인가 해줄 것이라는 무대책‧무책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