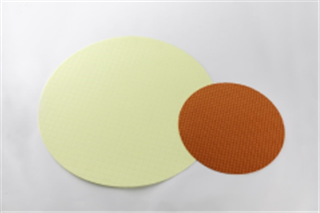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속국처럼 굴어 국가안보·경제가 위태로워진 후폭풍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팽창주의 노선을 강화하면서 한국은 안보·경제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은 과거에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하지 않았던가…
더군다나 2022년 들어서는 중국과의 수출입 무역수지도 적자로 돌아섰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및 소재 수입 급증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일보가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7월 중국 무역적자 1위는 LiB(리튬이온전지), 2위는 전구체(니켈·코발트·망간 화합물), 3위는 휴대용 데이터처리기기(노트북 등), 4위는 수산화리튬으로 나타났다.
휴대용 전자제품을 제외하면 배터리 및 소재가 적자를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며, 1-7월 적자가 총 62억5587만달러(8조50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LiB는 LG·SK가 중국 생산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전구체나 수산화리튬은 중국이 수출을 막으면 대체할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만약, 중국이 무역 보복으로 배터리 및 소재 수출을 중단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포스코케미칼을 중심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대응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일본산 수입에 의존할 수도 없다. 일본도 3년 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3개 화학소재의 한국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파국을 맞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일본산을 대체하기 위해 국산화 노력을 강화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중국산 수입으로 대체하는 수준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중국 의존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내기업들이 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산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했으나 무서운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증명했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나 훨씬 무서운 보복이 기다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독일이 좋은 예이다. 독일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함으로써 러시아의 보복성 공급감축·중단을 불렀으며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음은 물론 겨울철에는 화학공장을 비롯한 제조설비들이 가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이 사드 사태처럼 무역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국내 생산설비도 마비될 수 있다. 중국은 희소금속은 물론 리튬·구리·니켈 등 광물 투자에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면서 2022년 상반기에만 석탄, 니켈, 철광석, 철강 현물가격이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산업은 거시경제적 악재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에너지·원재료 코스트가 급상승한 가운데 거래가격은 폭락을 거듭함으로써 수익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중국의 협박과 압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수출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화학산업의 중국 의존도는 지나치다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