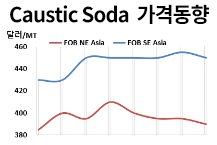석유화학제품의 중국 수출은 앞으로도 별 탈이 없을 것인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사드와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특별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의외의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이 북한제재에서 벗어나 한국제재로 선회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중국이 경제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수출입에 있어서도 2000년 이후 미국, 일본, 유럽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은 중국비중이 2015년 기준 26.0%로 홍콩을 포함하면 31.8%에 달해 절대적인 의존관계에 있고, 중국자본이 보유한 한국의 국채 등 상장 채권규모가 17조5000억원으로 18.1%를 차지해 역시 1위에 올라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2013년 기준 2만3000사에 달하고 있다. 더군다나 2015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45%인 600만명이 중국인이었고 중국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 400달러의 5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제재에 나선다면 한국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2010년 댜오위다오 사건 이후 일본의 중국 수출·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유입이 급감해 중국의 수입대상국 1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나섰을 때 석유화학은 어떠할까?
석유화학제품은 수입관세가 낮은 대표적인 국제상품으로 원료가격 등락 및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국이 함부로 한국산 수입을 규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PTA 및 PVC를 제외하면 중국이 자급수준에 이르지 못해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고서는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다고 미국산 수입을 크게 확대하기도 어렵고, 앙숙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산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일본은 이미 범용제품에서 탈피해 차별화했다는 측면에서 한국산을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 유럽은 이미 공급부족 상태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 논외이다.
물론, 중동산 수입을 확대하고 인디아 및 아세안과 교역을 확대하면 일정부분 대체할 수 있으나 에틸렌, PE, MEG 등을 제외하고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직접적으로 한국산 수입을 규제하기보다는 전기버스용 배터리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비관세 장벽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관검사를 통한 비관세 장벽 강화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중국의 고강도 경제제재를 피할 수는 있지만, 한국을 한반도 문제에서 책임 있는 대화상대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화학제품 교역에 있어 중국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 화학기업들도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석유화학은 중국이 수입을 규제하면 대책이 없다는 관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