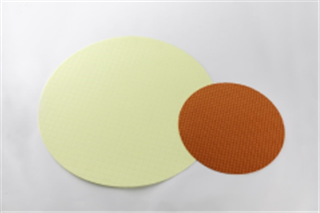화학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별다른 영향은 없으나 일부에서는 중국 생산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아시아 화학제품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18년 8월 반도체, 전자부품, 플래스틱·고무제품 등 160억달러 상당에 달하는 279개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16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자동차, 파지 등 333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상품목은 7월 시작된 340억달러를 포함해 500억달러에 달하며 양국은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500억달러 외에 2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11월부터 관세 10%를 추가 부과한 후 2019년 1월1일부터 25%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중국산 수입제품 전체(5500억달러 상당)를 대상으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석유화학 시장에서는 양국의 무역마찰이 장기화됨으로써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중간 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플래스틱제품 수요가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증가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화학기업들은 양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Mitsubishi Gas Chemical(MGC)은 경영기획부에 위원회를 설치해 관련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시점에서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한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미국에서 가동하고 있는 공장들은 일본 및 역내 공급 중심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서플라이 체인, 소비심리 냉각 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국 생산제품을 상호 융통하는 사례도 있어 일부에서는 앞으로 영향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Asahi Kasei Chemicals(AKC)은 미국 수출용 POM(Polyacetal)을 중국 장지아강(Zhangjiagang) 공장에서 생산했으나 일본 미즈시마(Mizushima) 공장 생산으로 전환했다.
POM은 자동차, 전자·전기부품 등에 사용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있다.
AKC는 글로벌 공급체제를 최적화하기 위해 이전부터 생산체제 전환을 검토했으며 무역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수출환경 악화는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부문, 지역을 불문하고 글로벌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화학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적절하고 기동적인 판매전략, 재고관리 뿐만 아니라 코스트 감축, 자산효율성 개선 등으로 사업기반을 계속 강화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양국의 무역전쟁은 아시아 석유화학 시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페인트, 잉크 용제에 사용하는 MEK(Methyl Ethyl Ketone)는 최근 가격이 톤당 1100달러 수준으로 2월에 비해 약 30% 급락했다.
중국 환경규제로 페인트 및 잉크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져 과잉물량이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으로 수출하던 중국산이 추가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아시아로 유입되면서 가격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PE(Polyethylene) 및 PVC(Polyvinyl Chloride)는 중국이 미국산에 관세 25%를 추가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나 미국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 공급과잉의 파장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PE는 CFR FE Asia 톤당 1100-1250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채 약세를 계속하고 있으며, PVC는 1000달러대에서 800달러대 중반으로 폭락했다.
에틸렌(Ethylene) 역시 FOB Korea 기준 1300달러대에서 110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고 머지않아 1000달러 이하로 폭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산 PE가 유입되면서 아시아 PE 플랜트의 가동률이 떨어져 에틸렌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