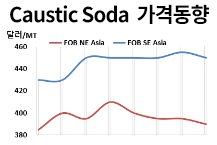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바이오연료 시장이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지구온난화 대책이 강화되면서 바이오연료 전환이 대세로 굳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연료 퇴출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정유기업 및 산업계의 혼란이 극심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환경경제연구소(IEEI)는 바이오연료가 운수 부문의 온난화 대책으로 트럭·항공·선박의 전동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폐식용유 베이스 생산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폐식용유 및 팜유 부산물 등 식물성 원료에 수첨반응해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 오일이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오연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은 글로벌 생산량이 2000년부터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수요가 감소하며 약 6%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HVO는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으나 FAME(Fatty Acid Methyl Ester)는 동·식물성 지방과 메탄올의 알칼리 촉매반응으로 생산함으로써 바이오연료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바이오연료 중 에탄올은 옥수수·사탕수수 생산량이 많은 미국과 브라질이 글로벌 생산량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FAME는 인도네시아·미국·독일 등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HVO는 생산량이 적고 생산국도 미국·EU(유럽연합)에 한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LG화학이 단석산업과 합작으로 HVO 생산을 시도하고 있으나 단석산업이 합작에 소극적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바이오연료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사료와의 원료 확보 경쟁,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우려, 높은 제조 코스트 등이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옥수수·밀·콩 등 바이오연료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 대부분이 식량에 해당하고, 글로벌 경지 면적의 7%만 바이오 원료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에 따른 삼림 벌채, 열대우림 문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리플래닛은 2020년 EU에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밀 330만톤과 옥수수 650만톤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2020년 수출한 밀의 20%, 옥수수의 25%에 달하고 있다. 리플래닛은 유럽이 바이오연료에 투입한 하루 평균 1만톤의 밀은 빵을 하루 약 1500만개, 1년이면 50억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바이오연료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생산기업들이 바이오연료에 투입되는 밀은 대부분 사료용이고, 전체 곡물 생산량의 7% 정도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연료가 국제유가 안정에도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운수부문의 소비 에너지 중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IEA는 2050년 운수부문의 바이오연료 사용비중을 26-40%로, 지구온난화 정부 협의체(IPCC)는 25-7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2021년 총회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실질 제로화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채택하고 목표 감축량의 2/3를 바이오 항공유인 SAF로 달성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의문시되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폐식용유, 팜유 부산물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역부족이고 앞으로 HVO, SAF 등 고부가가치화가 진행될 것이 확실시돼 국내기업들도 기술 개발을 적극화해야 한다.
바이오연료를 둘러싼 논쟁을 뒤로하더라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송 연료에 그치지 않고 산업용 연료도 바이오화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