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 화학기업들이 생산능력 확대 대신 저탄소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타이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에 따르면, 타이는 2024년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5%를 기록했다. 2024년 성장률 예상치 역시 2.5% 전후로 동남아시아에서 3번째로 낮은 편이다.
관광산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전산업 불황의 영향으로 제조업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며, 화학산업은 자동차용 부품·소재 수요 감소와 중국산 화학제품이 염가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량 유입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저탄소화와 환경 부하 저감 등 글로벌 공통 트렌드에 대응해 풍부한 농업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관련사업, 미개척 영역인 폐플래스틱 리사이클, 이산화탄소(CO2) 포집‧이용·저장(CCUS) 등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화학산업,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가동률 하락
타이 화학산업은 범용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시장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소화하지 못한 화학제품을 낮은 가격에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유임시킴에 따라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약화됐다.
Siam Cement Group(SCG)에 따르면, 화학제품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PE(Polyethylene)와 나프타(Naphtha)의 스프레드는 2024년 1분기 기준 톤당 3 54달러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이전 최대 수준이었던 2019년 1분기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됐다.
54달러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이전 최대 수준이었던 2019년 1분기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소 회복되던 PP(Polypropylene)와 나프타의 스프레드 역시 마찬가지로 50% 수준에 머물렀으며, PVC(Polyvinyl Chloride)와 중간원료인 EDC(Ethylene Dichloride)의 스프레드는 2019년 1분기의 60%로 떨어졌다.
분기별 스프레드 역시 약세로 파악된다.
PTTGC(PTT Global Chemical)에 따르면, 페놀(Phenol)과 BPA(Bisphenol-A), AN(Acrylonitrile) 등 중간제품은 원료와의 스프레드가 모두 2023년 4분기 대비 축소됐다.
시황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크래커를 가동하고 있는 화학기업들은 낮은 가동률로 대응하고 있다.
PTTGC는 가동률이 2023년 4분기 78%, 2024년 1분기 83%에 불과했으며 같은 PTT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인 IRPC도 가동률이 78%, 79%에 머물렀다.
SCG의 계열사인 SCG Chemicals(SCGC) 역시 가동률을 낮추면서 1분기에는 폴리올레핀(Polyolefin)과 중국 등에서 수요가 부진한 PVC 판매량이 각각 20% 급감했다.
인도라마·PTT, 포트폴리오 재검토
타이 화학기업들은 영업실적 악화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최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메이저로 평가되는 인도라마(IVL: Indorama Ventures)는 중국의 PET 및 원료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신증설의 영향으로 글로벌 가격이 하락하고 유럽에서 원료비 상승이 이어지는 등 마진이 악화되면서 수익성이 감소했다.
인도라마는 시장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구조개혁 IVL 2.0의 일환으로 기존의 인수를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성장모델을 재검토하고 PET 체인의 슬림화 방침을 발표했다.
인도라마는 미국 텍사스 코퍼스크리스티(Corpus Christi)에 건설하고 있는 PTA와 PET 대형 플랜트를 포함한 글로벌 7개 생산기지와 그룹 전체 생산능력의 10%를 대상으로 생산능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EG(Ethylene Glycol)와 EO(Ethylene Oxide), MTBE(Methyl tert-Butyl Ether) 라인업을 보유하지 못한 유럽 사업장은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재편이 유력해지고 있다.
PTTGC는 2024년 5월 아사히카세이(Asahi Kasei)와 50대50으로 합작한 AN(Acrylonitrile) 생산기업 PTT Asahi Chemical의 고정자산에 대해 총 906억엔(약 8234억원)의 감손손실을 계상했다.
PTT Asahi Chemical은 AN 시황이 악화되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방향성을 분명히하기 위해 PTTGC와 아사히카세이가 협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IRPC가 25%의 지분을 보유한 우베(UBE) 그룹의 UBE Chemicals Asia도 사업 재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기업의 신증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카프로락탐(Caprolactam)과 PA(Polyamide) 생산 축소를 포함해 재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SCGC가 사운을 걸고 도전하는 베트남 남부 롱손(Long Son) 석유화학 컴플렉스 사업도 2023년 이후 수차례 전면적인 상업가동을 연기하는 등 사업환경 악화에 따라 글로벌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SCG, 저탄소 시멘트로 친환경 트렌드 대응
석유화학사업이 대부분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저탄소화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SCG는 2024년 전체 설비투자액 400억바트(약 1조5568억원) 가운데 25%인 100억바트를 식물 베이스 바이오 PE와 저탄소 시멘트 사업 확대 등 온실가스(GHG) 저감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멘트는 SCG가 영위하는 사업군 가운데 전통적인 사엽이나 소성 프로세스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저탄소화가 시급한 상태이다.
SCG는 자체 개발한 저탄소 시멘트 생산·공급 및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출시한 1세대 저탄소 시멘트는 생산 과정에서 톤당 0.05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으며, 2024년 5월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 추가 감축한 2세대를 출시했다.
SCG는 시멘트 사업에서 주로 석탄을 열원으로 사용했으나 목재 칩, 펠릿(Pellet), 폐플래스틱 등 대체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독자적인 바이오매스 펠릿도 개발하고 있으며 파트너와 함께 신기술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 화학기업들은 저탄소화 뿐만 아니라 고부가치화를 통해서도 시장환경 극복을 추진하고 있다.
IRPC는 주로 범용 용도로 공급하던 폴리올레핀의 특수 그레이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 내구성이 우수해 매설용 파이프 원료로 사용되는 HDPE(High-Density PE)와 약 섭씨 90도의 내열성을 지녀 열탕용 파이프에 적합한 PP 랜덤 코폴리머 사업과 고성능 미립자 에어필터 소재로 이용되는 부직포용 PP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네이처웍스, 2025년 사탕수수 베이스 PLA 7만5000톤 생산
타이는 미국과 중국을 대신하는 새로운 바이오 화학제품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타이는 쁘라윳 짠오차 정권이 주장한 BCG(바이오·환경·그린) 경제모델 정책에 힘입어 바이오 관련산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지 메이저는 바이오매스 플래스틱 상업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기업들도 타이의 풍부한 농업 식물 잔사물에 주목해 바이오 화학제품 밸류체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PTTGC는 미국 곡물 메이저 카길(Cargill)과의 합작법인 네이처웍스(NatureWorks)를 통해 2025년 2분기부터 바이오매스 플래스틱인 PLA(Polylactic Acid)를 상업생산할 계획이다.
 네이처웍스는 PTTGC 계열사와 함께 타이 북부 나콘사완현(Nakhon Sawan)에 PLA 설비를 포함하는 나콘사완 바이오 컴플렉스(NBC)를 건설하고 있다. PLA 생산능력은 7만5000톤이며 사탕수수즙을 원료로 사용한다.
네이처웍스는 PTTGC 계열사와 함께 타이 북부 나콘사완현(Nakhon Sawan)에 PLA 설비를 포함하는 나콘사완 바이오 컴플렉스(NBC)를 건설하고 있다. PLA 생산능력은 7만5000톤이며 사탕수수즙을 원료로 사용한다.
SCG는 브라일 메이저 브라스켐(Braskem)이 생산하는 바이오 PE도 타이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SCG는 브라스켐과 합작해 사탕수수, 카사바, 옥수수 베이스 바이오 에탄올(Ethanol)을 원료로 바이오 에틸렌(Ethylene)까지 사업화할 예정이다. 생산능력은 20만톤으로 2025년 가동한다. 폴리머 사업은 SCGC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바이오 PE 가동 후 일정기간 타이산 식물 원료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타이에서는 사탕수수 등 상품작물 재배와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 대규모화돼 있지 않아 코스트가 가중되며, 생산체제가 합리화된 브라일에서 수입하는 편이 코스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타이 정부가 추진하는 BCG 경제모델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의 수입 증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일본 도레이(Toray) 역시 타이에서 식물 베이스 화학제품 사업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타이 동북부 우돈타니(Udon Thani) 소재 Cellulosic Biomass Technology(CBT) 공장에서 나오는 사탕수수 찌꺼기(버개스: Bagasse)와 전분공장의 카사바 펄프 등 비식용 원료로 셀룰로스(Cellulose) 당을 생산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화학제품 생산이 목적이며 도레이는 식물 베이스 PA66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실증할 계획이며 이미 중간원료인 아디핀산(Adipic Acid)을 셀룰로스당으로부터 생산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개스로부터 셀룰로스당을 생산할 때 부산되는 폴리페놀(Polyphenol)도 사료용 등으로 상업화할 방침이다.
SAF, 팜 오일 대신 폐식용유 주목
에너지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본격 생산을 곧 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
SAF는 농업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타이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원료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던 타이산 팜유(Palm Oil)가 재배·생산 이력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가능성 인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실상 폐식용유와 버개스로 제한되고 있다.
폐식용유 베이스 사업화는 타이 석유·에너지 메이저 BCP(Bangchak Corporation)가 선도하고 있다.
2025년 1분기에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며 합작 파트너인 식용유 생산기업이 폐식용유 회수·운반을 담당하고, BCP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도 폐식용유를 매입할 계획이다.
BCP는 일본 스미토모(Sumitomo)상사와도 연계해 중국에서 회수한 폐식용유까지 이용할 방침이며 안정적으로 원료를 조달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코스모오일(Cosmo Oil)과는 SAF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A(Energy Absolute)와 PTT그룹도 SAF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SAF 상업생산이 임박한 가운데 연료 뿐만 아니라 화학제품도 대규모로 생산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프로젝트도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ATJ(Alcohol to Jet) 기술로, BCP가 도입하는 허니웰(Honeywell UOP)의 ATJ 기술은 바이오 에탄올을 탈수함으로써 에틸렌을 만들고 올리고머화와 수소화를 거쳐 제트 연료를 생산한다.
ATJ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하는 바이오 에틸렌은 화학제품 원료로도 이용 가능해 화학기업과 상사 등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TTGC, 3 스텝 플러스 전략으로 동남아 허브 조성
PTTGC는 맙타풋(Map Ta Phut) 사업장을 동남아시아의 기능성 화학제품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PTTGC는 2023년 쿠라레(Kuraray), 스미토모상사와 합작한 Kuraray GC Advanced Materials를 완공하고 전자·자동차용 EP(엔지니어링 플래스틱)인 고내열성 PA9T와 수소첨가 스타이렌(Styrene)계 TPE(Thermoplastic Elastomer) 생산을 시작했다,
PTTCG는 합작공장에 파이프라인으로 원료인 부타디엔(Butadiene)을 공급하고 석유화학사업 밸류체인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AGC와 합작한 AGC Vinythai도 PVC 증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2분기에 상업가동 예정이다.
PTTGC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스텝 체인지 △스텝 아웃 △스텝 업으로 이루어진 3 스텝 플러스(3 Step Plus) 전략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스텝 체인지는 타이 동부 라용현(Rayong) 소재 맙타풋 사업장의 효율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며 최우선 목표는 코스트다운, 환경부하 최소화, 밸류체인 최적화이다.
PTTGC는 올레핀 재구성 프로젝트(ORP)와 올레핀 개량 프로젝트(OMP) 등 크래커 신규 건설·개보수 계획을 통해 맙타풋 사업장의 원료 선택 유연성을 확대했다.
스텝 아웃 전략은 장기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글로벌 사업 추진의 핵심 개념으로 PTTGC는 자회사 올넥스(Allnex)를 통해 글로벌 기능성 화학제품 및 코팅수지 사업을 성장시킬 방침이다. 올넥스는 중국 허브에 이어 인디아에도 공장을 건설했다.
맙타풋 공장도 자동차와 전자, 반도체, 포장, 금속, 가구, 특수장식 등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의 특수화학제품 용도를 중심으로 동남아 허브로 올넥스의 뒤를 이을 예정이다.
PTTGC는 또 고도화되는 지속가능한 이노베이션 수요에 대응해 카길과의 합작법인인 네이처웍스를 통한 바이오·친환경 화학제품 생산 등 타이가 동남이시아의 바이오 화학제품 생산·수출기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텝 업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PTT그룹 전체가 협력해 타이 최초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CCS 기술 연구개발(R&D)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CVC)을 통해 유망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CCS 상용화에 성공하면 타이의 탈탄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TTGC는 블루수소와 그린수소 관련 사업 타당성조사(FS)와 장래 상업이용을 위한 사업모델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우성 선임기자: yys@chemlocu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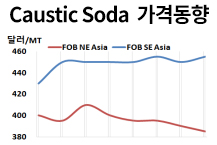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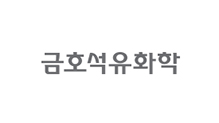












 54달러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이전 최대 수준이었던 2019년 1분기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됐다.
54달러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이전 최대 수준이었던 2019년 1분기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됐다. 네이처웍스는 PTTGC 계열사와 함께 타이 북부 나콘사완현(Nakhon Sawan)에 PLA 설비를 포함하는 나콘사완 바이오 컴플렉스(NBC)를 건설하고 있다. PLA 생산능력은 7만5000톤이며 사탕수수즙을 원료로 사용한다.
네이처웍스는 PTTGC 계열사와 함께 타이 북부 나콘사완현(Nakhon Sawan)에 PLA 설비를 포함하는 나콘사완 바이오 컴플렉스(NBC)를 건설하고 있다. PLA 생산능력은 7만5000톤이며 사탕수수즙을 원료로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