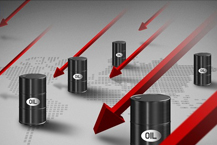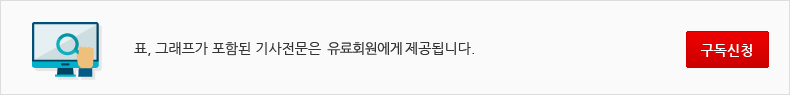화학기업들은 과연 4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비하고 있는가?
켐로커스의 기사 서치수를 살펴보면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이나 정밀화학제품 시장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기사는 서치수가 많은 편이나 ICT, 인공지능, 로봇 관련기사는 꼴찌 수준이고 센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인공지능(AI)·로봇·센서·생물합성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질병·에너지·교육 등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세계 500대기업 가운데 약 70%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경고가 일반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으나 인류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면서 최상의 권력으로 부상한 애플, 삼성전자, GE, 벤츠, 포드와 같은 글로벌기업도 결코 안전할 수 없게 급변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DowDuPont, BASF, Bayer, Sabic, Aramco, Sinopec, PetroChina, Henkel, SK이노베이션,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한화케미칼, GS칼텍스, 삼성SDI 등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언제 서적을 판매하는 아마존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으며, 우버가 택시 운전사들의 밥줄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누군가는 드론이 도시를 뒤덮기 시작할 때 거대한 산업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아무 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고 일갈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파괴적 경쟁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분출하는 혁명적인 신기술로, 여러 산업과 불특정기업이 서로의 영역을 잠식함으로써 글로벌기업들도 10년 안에 시장에서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화학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 손을 놓고 있어도 결국에는 다급한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먼 산을 구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GM 사태가 터지자 자동차에 들어가는 화학제품 판로가 막힐 수 있다며 애간장을 태우는 것처럼 테슬라가 전기자동차를 실용화했을 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사고해본 경험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직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적인 사업가처럼 행동하도록 격려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지는 못할망정 밥 벌어먹기도 힘든 판국에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고 야단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은 아닐까?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죽어가는 사회와 경쟁력을 상실한 도태 대상기업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를 조성해주어야 하고, 스타트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납품받아주는 척 시늉하면서 탈취하는 도적질을 방지해 파트너십을 맺고 M&A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용기를 갖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화학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이 R&D부서나 연구소의 몫이 아니라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체 부서가 협력해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경쟁이 가져올 파괴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혁신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