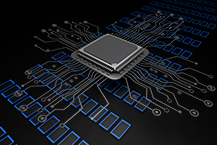미국은 어느 수준으로 확장할 것인가? 중동은 언제까지 영토 확장을 계속할 것인가? 한국은 끝없이 질주를 계속할 것인가? 일본은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중국은 언제까지 한국산을 의지하고 있을 것인가? 아세안의 위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인가?
에틸렌을 둘러싼 글로벌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역학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코스트가 낮은 셰일가스 베이스 신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됐지만 2018년부터 확장을 본격화해 2019년에는 미국산 PE가 아시아 시장에 대량 유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동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3000만톤에 가까운 생산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석유의 고부가화 차원에서 석유화학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에틸렌 유도제품 투자를 확대해 고부가화 전략을 적극화하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원유에서 나프타 및 LPG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석유화학제품 또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 개발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만약, 중동 메이저들이 탈석유 전략에서 나아가 원유에서 직접 화학제품을 생산한다면 기존 석유화학기업들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생존이 가능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란도 변수로,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주춤거리고 있지만 막대한 인구와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사우디를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도 에틸렌 생산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어 3-4년 후에는 3000만톤에 가까운 생산체제를 확립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조짐을 보임으로써 한국산 수입에서 서서히 철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기업들은 아직도 중국시장에 연연하고 있지만 중국은 결코 한국에게 그리 우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3-4년 전 백화점 인가 경쟁을 벌일 때 사드 보복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어제 같은데 과연 화장품은 언제까지 호황타령으로 날을 샐 것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앞이 훤한데도 당사자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세안은 어떠한가? 3-4년 전까지도 개발도상국에 머물렀으나 베트남을 중심으로 산업화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고 타이 석유화학산업은 이미 한국을 넘보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싱가폴은 그렇다 치고 말레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하면 한국을 위협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2의 중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30년 전 아시아를 주름잡던 일본을 밀어내고 한국이 아시아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듯이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을 밀어내고 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4억이 넘는 인구까지 감안하면 한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노후 크래커를 스크랩하면서 서둘러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까지는 성공적이었으나 너무 서두른 나머지 한국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후회가 깊다고 들린다. 일부에서 스팀 크래커를 효율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신식 고효율 크래커를 신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중국은 영원한 수입대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아세안은 쫓아올 날이 한창 남았으며, 미국은 한때 큰소리치고 물러날 것이다. 중동은 어차피 한계가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지만 적을 모르고 자만에 빠지면 필패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