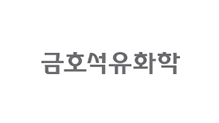아시아 합성수지 시황이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2018년 범용수지 가격이 일제히 하락한 바 있으나 2019년에는 PVC(Polyvinyl Chloride)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는 소폭이나마 개선된 반면 PE(Polyethylene), PP(Polypropylene)는 여전히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
PVC는 공급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래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
특히, 인프라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시장의 성장이 상승을 이끌었으며 타이 역시 2019년 수도관 정비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수요 증가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남아 전체적으로는 2019년 수요가 5%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PVC는 6월 톤당 850달러 전후를 형성하며 5월에 비해 30달러 정도 상승했고 900달러대에 거래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ET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PET수지는 2019년 1분기 평균 가격이 톤당 1200달러로 200-250달러 하락했으나 최근 병(Bottle)용 성수기가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P-X(Para-Xylene) 등 원료가격 폭락에 따라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
반대로 폴리올레핀(Polyolefin)은 여전히 마진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말 급락한 후 2019년에는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회복된 것처럼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전년동월대비 10% 정도 약세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LLDPE(Linear Low-Density PE)는 미국산 셰일(Shale) 베이스 유입이 늘어난 가운데 주요 수요처였던 중국이 관세를 올려 타격이 커지고 있다.
PP는 2018년 베트남 응이손(Nghi Son) 정유공장에서 생산능력 40만톤의 대규모 설비가 상업생산에 돌입한 가운데 효성화학 역시 베트남에서 신규 30만톤 상업화를 준비하고 있고 생산능력을 60만톤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어서 공급과잉이 도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시황 악화가 예상된다.
PVC는 다른 수지에 비해 아시아의 자가소비 비중이 높고, PET는 중국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시황 악화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PE는 한국·타이의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미국-중국 무역마찰로 수요까지 감소함으로써 앞으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은 중국 수요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한동안 고전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인 모리카와 코헤이 쇼와덴코(Showa Denko) 사장은 2019년 5월23일 정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모리카와 코헤이 회장은 “당초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셰일 베이스 PE 수출을 본격화해도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며 흡수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시장이 계속 확대할 것이라는 조건이 대전제였다”면서 “기본적인 전제가 붕괴된 지금은 여러 예측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경제는 미국이 호조를 계속하고 있고 독일 역시 3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유럽경제 역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속 확대해나간다면 중국경제가 받을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1-3월 PE 수입을 전년동기대비 25%, PS(Polystyrene)는 34% 확대하는 등 여전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중국 무역마찰 회피를 위한 틈새수요와 페플래스틱 수입금지에 따른 대체 수입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실수요 자체가 어떠한 상황인지는 분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미국은 2018년 PE 수출이 649만톤으로 전년대비 47% 급증하는 등 셰일 베이스 PE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미국 석유화학기업들이 중국에 직접 수출하면 관세 부과 리스크가 높아 중동·아시아 소재 자사설비를 활용해 우회 수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