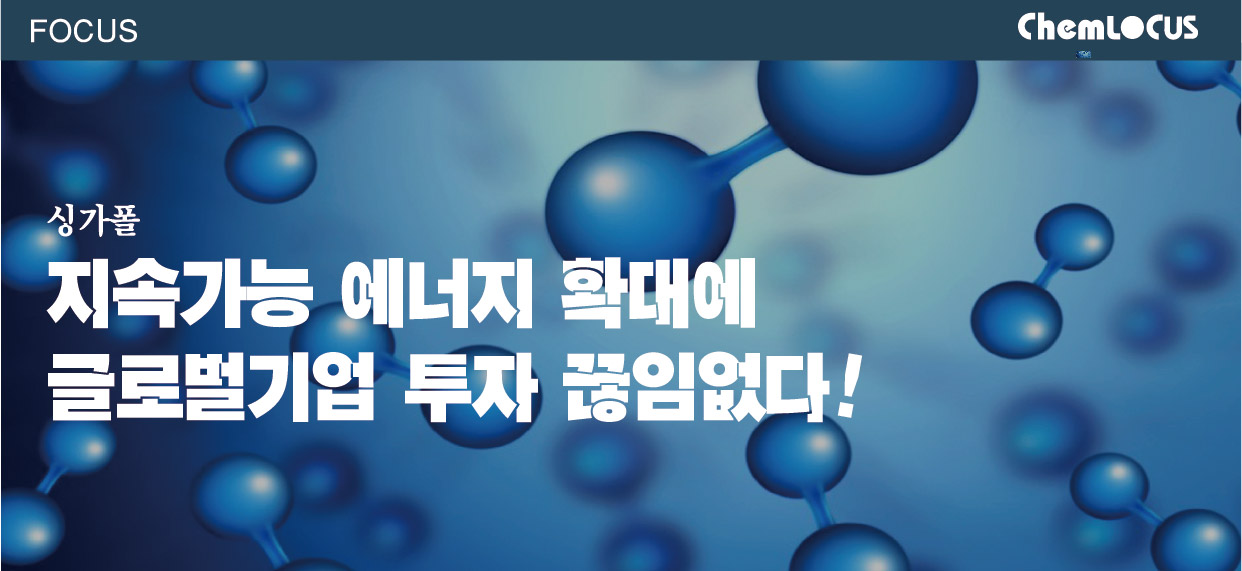
싱가폴 에너지·화학산업이 요동치고 있다.
싱가폴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 화학 허브를 표방한 이후 관련 투자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신증설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기존제품 생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투자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글로벌기업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메이저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어 싱가폴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쓰이케미칼, 페놀 매각하고 Tafmer 증설
일본 미쓰이케미칼(Mitsui Chemicals)은 싱가폴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미쓰이케미칼은 2023년 7월 100% 자회사 MELS(Mitsui Elastomers Singapore)가 생산하는 에틸렌 α-올레핀(Ethylene α-Olefin) Tafmer 신규 플랜트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4년까지 12만톤을 완성해 현지 생산능력을 총 34만5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Tafmer는 플래스틱의 성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수지 개질재 및 연질성형 소재로 유연하고 가벼워 태양전지(PV) 관련 부품, 포장재, EP(엔지니어링 플래스틱) 개질재, 스포츠화, 자동차 부품 등 광범위 영역에서 사용되며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Tafmer는 플래스틱의 성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수지 개질재 및 연질성형 소재로 유연하고 가벼워 태양전지(PV) 관련 부품, 포장재, EP(엔지니어링 플래스틱) 개질재, 스포츠화, 자동차 부품 등 광범위 영역에서 사용되며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태양전지 봉재지용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미쓰이케미칼은 2003년 싱가폴에서 Tafmer 생산을 개시한 이래 생산라인 2개를 가동하고 있으며 2021년 봄 정기보수를 통해 생산능력을 10% 추가한 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플랜트 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2023년 4월에는 Mitsui Phenols Singapore 자산 전부를 3억3000만달러(약 4423억원)에 영국 이네오스페놀(Ineos Phenol)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네오스페놀은 Mitsui Phenols Singapore 인수를 통해 생산능력을 큐멘(Cumene) 41만톤, 페놀(Phenol) 31만톤, 아세톤(Acetone) 18만5000톤, AMS(α-Methylstyrene) 2만톤, BPA(Bisphenol-A) 15만톤 추가했다.
BPA를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했으며 인수사업 매출이 7억5000만달러(약 1조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 벨기에, 독일에 머물렀던 사업영역을 아시아로 확장함에 따라 글로벌 수요기업 확보에 큰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스테, SAF 100만톤 체제로 확대
핀란드 네스테(Neste)는 싱가폴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네스테는 2019년부터 진행한 투아스(Tuas) 정유공장 증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가동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6억유로(약 2조2724억원)를 투입한 프로젝트로 전체 생산능력을 260만톤으로 확대했다.
지속가능 항공연료(SAF)는 최대 100만톤 공급 가능하며 전처리능력을 함께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처리가 어려웠던 폐기물 및 잔사물까지 원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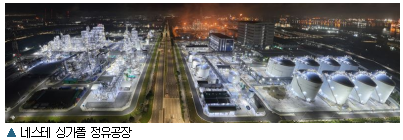
SAF를 생산해 기존 화석 베이스 제트연료와 혼합한 후 제트연료 요구 사양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한 다음 최종적으로 창이(Changi) 국제공항에서 수요기업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창이공항에서 SAF를 직접 공급하기 위해 연료저장기업 CAFHI(Changi Airport Fuel Hydrant Installation) 지분을 소량 인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네스테는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Amsterdam), 핀란드 헬싱키(Helsinki) 공항에서 SAF를 항공기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 상태이다.
에보닉, DL-메치오닌 4만톤 증설
에보닉(Evonik Industries)은 기존제품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에보닉은 2019년 싱가폴에서 DL-메치오닌(Methionine) 생산능력을 약 30만톤까지 확대했으며 2023년 3월부터 수천만유로를 투입해 4만톤을 증설하고 전체 생산능력을 34만톤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에보닉은 2019년 싱가폴에서 DL-메치오닌(Methionine) 생산능력을 약 30만톤까지 확대했으며 2023년 3월부터 수천만유로를 투입해 4만톤을 증설하고 전체 생산능력을 34만톤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증설분에 대한 탄소발자국을 기존 대비 50% 감축해 싱가폴산 메치오닌 전체 탄소발자국 중 6%를 줄일 방침이다.
성장시장인 아시아 수요기업에 대한 공급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4만톤 증설에 나선 것이며 공사를 2024년 3분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린데(Linde)는 에보닉의 DL-메치오닌 증설에 대비해 주롱섬(Jurong)에 싱가폴 최대규모인 9MW 알칼리 수전해조를 건설·가동할 예정이다.
또 에보닉과 주롱 수전해조에서 생산하는 그린수소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전해조는 2024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엑손모빌, 수소에너지 이용 관심
미국 엑손모빌(Exxonmobil)은 싱가폴에서 수소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엑손모빌은 Exxonmobil Asia Pacific을 통해 Keppel Infrastructure와 현지에서 실현 가능한 저탄소 수소·암모니아(Ammonia) 상용화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eppel Infrastructure는 2026년까지 주롱섬에 싱가폴 최초 수소대응형 발전소를 건설하고 저탄소 수소를 사용용할 계획이며, 엑손모빌은 미국 텍사스에 글로벌 최대급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플랜트를 건설해 2027년 가동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탱크터미널 메이저 보팍(Vopak)은 싱가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에 주목해 2022년 말레이지아 국영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밸류체인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팍 터미널로부터 페트로나스가 확보한 저류지까지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까지 포집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FS)를 수행하고 있다.
주롱섬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능력을 최소 200만톤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수요기업 모색 및 원료·연료 이용방안, 해외 저류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유국이자 가스 생산국인 말레이지아는 고갈 가스전을 이용하는 CCS에 적합한 지층이 많아 페트로나스가 글로벌기업과 파트너십 추진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쉘, 차세대 에너지에 최대 20조원 투자
쉘(Shell)은 싱가폴에서 지속가능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쉘은 이미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한 LNG(액화천연가스), 수소, CCS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주롱섬과 부콤섬(Bukom)을 아우르는 정제·화학 컴플렉스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 사업장은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북미와 중국 사업장은 유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LNG 생산량을 25-30%, 조달량을 15-25%, 판매량을 20-30% 늘리는 동시에 석유 생산량을 유지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확대된 에너지 공급 안정화 니즈를 흡수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연료, 수소, 전기자동차(EV) 충전, CCS 등 저탄소 에너지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2025년 100억-150억달러(약 13조3850억-20조원)를 투자하며 LNG, 저탄소 연료, 전기자동차 충전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수소, CCS 투자를 통해 미래 수익원을 확대하기 위한 선택지를 늘릴 방침이다.
반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화학제품 분야는 재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싱가폴 사업장 매각을 포함 전략적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매각 대상을 100% 자회사 SEPC(Shell Eastern Petrochemicals)의 화학제품 플랜트에 한정했으나 유럽 사업장도 일부 가동중단 또는 매각을 통해 고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EPC는 중국을 제외하면 쉘이 아시아에서 가동하는 유일한 정유·화학 생산기지이며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 100만톤의 ECC(Ethane Cracking Center)와 MEG(Monoethylene Glycol), SM(Styrene Monomer) 플랜트 등을 가동하고 있다.
쉘은 2021년에도 부콤섬에서 석유정제능력을 50%, 에틸렌 생산능력은 20% 감축한 바 있다.
다만, 폐플래스틱 베이스 열분해유 정제설비를 건설하고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매스 베이스 항공연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3월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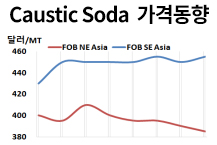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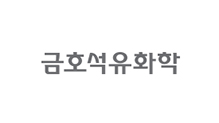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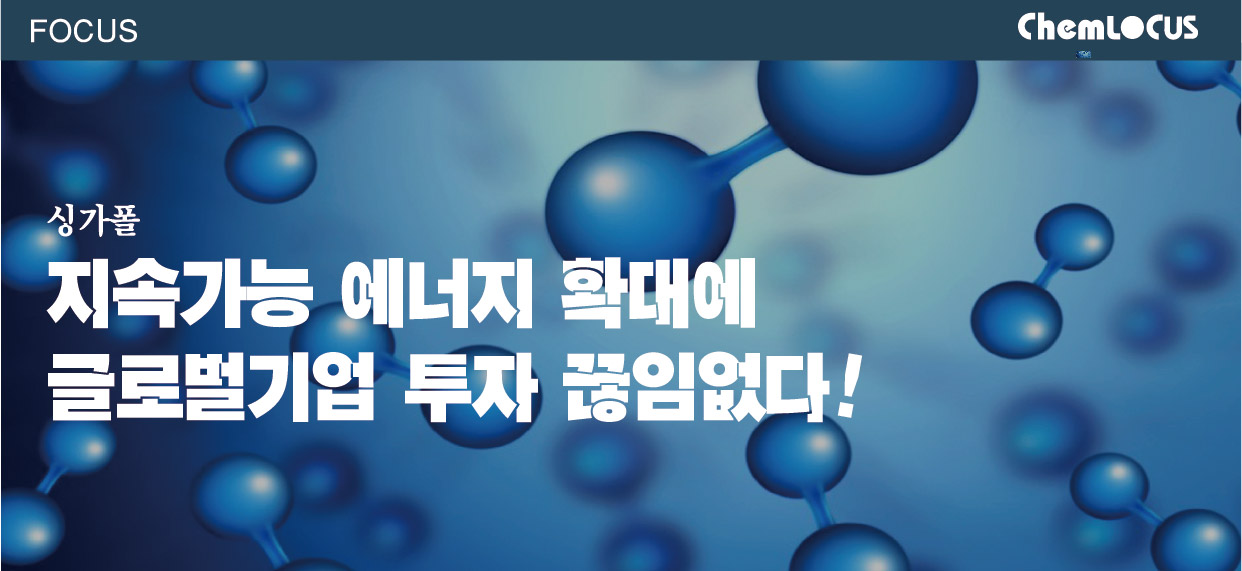
 Tafmer는 플래스틱의 성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수지 개질재 및 연질성형 소재로 유연하고 가벼워 태양전지(PV) 관련 부품, 포장재, EP(엔지니어링 플래스틱) 개질재, 스포츠화, 자동차 부품 등 광범위 영역에서 사용되며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Tafmer는 플래스틱의 성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수지 개질재 및 연질성형 소재로 유연하고 가벼워 태양전지(PV) 관련 부품, 포장재, EP(엔지니어링 플래스틱) 개질재, 스포츠화, 자동차 부품 등 광범위 영역에서 사용되며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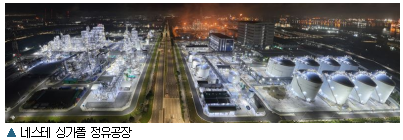
 에보닉은 2019년 싱가폴에서 DL-메치오닌(Methionine) 생산능력을 약 30만톤까지 확대했으며 2023년 3월부터 수천만유로를 투입해 4만톤을 증설하고 전체 생산능력을 34만톤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에보닉은 2019년 싱가폴에서 DL-메치오닌(Methionine) 생산능력을 약 30만톤까지 확대했으며 2023년 3월부터 수천만유로를 투입해 4만톤을 증설하고 전체 생산능력을 34만톤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