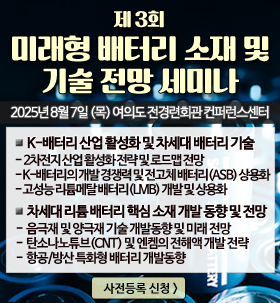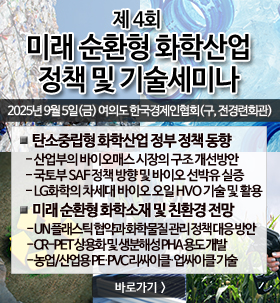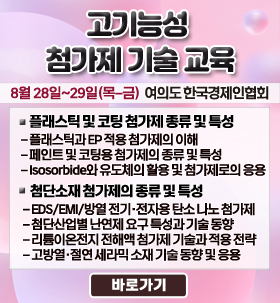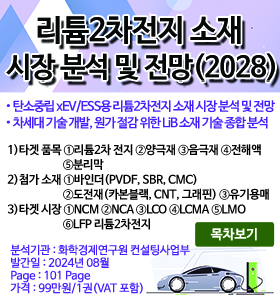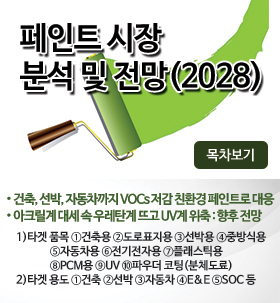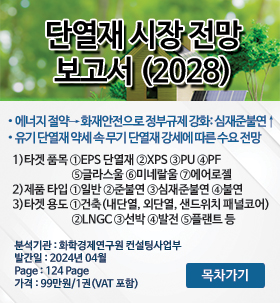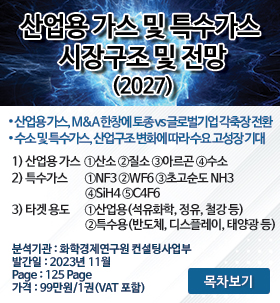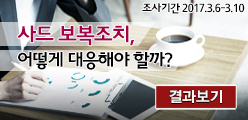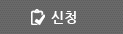|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화학합성 기술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화학산업은 이산화탄소(CO2)를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화학합성 기술이 정착되면 생산방식과 원료를 전환함으로써 탈탄소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 화학기업들은 화학합성 기술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lectro, 고체 고분자 전해질 전해합성 개발
요코하마(Yokohama)국립대학 스타트업 Electro Fluxion은 연료전지 원리를 응용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SPE) 전해합성 기술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SPE 전해합성은 연료전지의 전해 셀을 응용해 전기를 일으켜 주요 화학반응인 산화환원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이며, 전해 셀은 전극과 막을 밀착시키는 제로 갭 구조로 전기저항을 낮추어 투입 전력 대비 목표 화합물 생산량인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전환함에 있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의약품 원료로 이용하는 피리딘(Pyridine), 피페리딘(Piperidine)은 일반적으로 고온·고압 조건에서 수소를 첨가하는 환원반응으로 생산하는데 SPE 전해합성으로 대체하면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을 이용하는 화학반응 대비 총비용도 20-70%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lectro Fluxion은 기능성 화학제품, 에너지, 금속, 무기소재 생산기업에게 솔루션 공급을 목표로 기술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Mechanocross, 기계화학 유기합성 상용화
홋카이도(Hokkaido)대학 스타트업 Mechanocross는 석유 유래 유기용매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인 힘으로 화합물을 합성하는 기계화학(Mechano Chemical) 유기합성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이나 광물 분쇄에 사용하는 볼밀(Ball Mill) 등을 이용해 원료를 강하게 혼합함으로써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분산 상태를 만들어 유기합성 반응을 일으키는 기술이다.
유기합성 반응은 일반적으로 유기용매 속에 원료를 녹여 수행하는데 기계화학으로 대체하면 반응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5분의 1, 폐기물량을 약 15분의 1로 감축할 수 있으며 반응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코스트를 30-4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플링 반응을 중심으로 약 20종의 반응에 적용 가능하며 의약품 원료 생산용 유기합성 반응의 30% 이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또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배터리 소재 등에 이용하는 불용성 화합물도 합성할 수 있다.
2026년을 목표로 JGC, 분쇄장비 생산기업과 협력해 1배치당 100킬로그램까지 처리능력을 개선하는 양산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이셀(Daicel)을 비롯한 화학·제약기업과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다.
고베(Kobe)대학 스타트업 Photo-on-Demand Chemical은 메탄(Methane)이나 염소에 상온·상압 상태에서 강한 자외선을 조사해 화합물을 생산하는 Photo-on-Demand 합성이라는 독자공법을 개발하고 있다.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일종인 소화 가스로부터 포스겐(Phosgene) 등 다양한 화합물을 합성하는데 성공했으며 소화 가스에 산소와 염소를 혼합해 클로로포름(CHCl3)을 얻은 다음 강한 자외선을 조사해 포스겐 및 포스겐 유도체인 17종의 화합물 합성 가능하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Photo-on-Demand Chemical은 AGC, DKS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2025년 포스겐 유도제품 가운데 하나인 특정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약품부터 암모니아까지 친환경 생산 기대
스타트업 iFactory는 의약품 및 기능성 화학제품용 모듈형 전자동 연속생산설비를 개발하고 있다.
원료 공급부터 추출 여과, 건조, 충진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중규모 배치 생산과 시간당 10킬로그램, 1년에 최대 72톤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면적을 50% 이상 간소화할 수 있으며, 한변에 2-3미터 정육면체 모듈형으로 공정을 정밀하게 자동제어하기 때문에 인력 절감 효과가 있어 기존 배치 식 설비보다 소형이면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식 설비보다 소형이면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화학(Microwave Chemical)은 전자레인지 가열 원리를 응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고효율로 화학제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크로파화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반 전력과 마이크로파를 조합하면 기존 화석연료 기반 화학제품 제조공정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양한 파트너와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분자 수준까지 분해해 원료로 재활용하는 CR(Chemical Recycles)과 금속·희귀금속 생산 공정에 마이크로파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CR 분야에서는 20곳 이상의 파트너와 30건 이상, 금속·희소금속 분야에서도 복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subame BHB, 저온‧저압 암모니아 합성 실현
도쿄과학대학(Science Tokyo) 스타트업 Tsubame BHB는 고온·고압 상태에서 공기 중의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키는 하버-보슈(Haber-Bosch)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합성과 달리 독자적인 전자화물(Electride) 촉매를 사용해 저온·저압의 소형 설비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시스템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먼저 비료 생산 용도 등으로 소형·중형 설비화하고 2030년 이후에는 연료용 암모니아, 수소 캐리어 등 에너지 용도의 대형 설비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2호기 수주를 확정하고 유럽 등 글로벌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다른 도쿄과학대학발 스타트업 Ammon Fields는 저온·저압에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철-수소화물(Hydride) 촉매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속 원자와 음전하를 지닌 수소를 결합시킨 금속수소 화합물과 철을 복합화한 촉매로 섭씨 100도, 10기압 조건에서 암모니아 합성이 가능하며 철-수소화물 촉매를 사용하면 기존 촉매 대비 설비 투자비를 약 15%, 가동 비용을 약 1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mmon Fields는 2023년 도요엔지니어링(Toyo Engineering),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FCC와 상업화를 위한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하루 생산능력 수백-수천톤급 중·대형 설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계 원료 대체 움직임 “활발”
화학제품 원료를 석유에서 친환경 원료로 대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도쿄과학대학 스타트업 Green Chemical은 비식용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기능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목질 펄프, 야자껍질 등에 포함된 셀룰로스(Cellulose)에서 추출한 당인 글루코스(Glucose)를 원료로 독자적인 고체 루이스산(Lewis Acid) 촉매를 사용해 HMF(Hydroxy Methyl Furfural)를 고순도로 생산하는 기술이 고평가되고 있다.
HMF는 의약품, 기능성 식품, 바이오 플래스틱 원료 등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Green Chemical은 수요기업 및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2027-2030년경 사업화할 계획이다.
도쿄과학대학 스타트업 iPEACE223은 바이오 에탄올(Bio-Ethanol)을 출발 원료로 바이오매스 유래 기초화학제품인 바이오 프로필렌(Bio-Propylene) 및 유도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iPEACE223은 에틸렌(Ethylene)으로부터 프로필렌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올라이트(Zeolite) 촉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수톤-수십톤 바이오 프로필렌 벤치설비를 도입해 기술 실증을 시작하고 2028년 수천톤 소형 상용설비를 건설해 2030년 상용화할 계획이다.
RITE와 스미토모베이클라이트(Sumitomo Bakelite)가 설립한 Green Chemicals는 비식용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를 이용해 미생물로 방향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해 방향족 원료인 페놀(Phenol), 페놀 중간체인 4-HBA, 의약품 원료 및 기능성 식품소재인 PA(Protocatechuic Acid), 인플루엔자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하는 시킴산(Shikimic Acid) 등 방향족 화합물을 바이오 프로세스로 고효율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라이선스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수요기업에게 제안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수요기업이 4-HBA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4-HBA는 슈퍼 EP(엔지니어링 플래스틱)인 LCP(Liquid Crystal Polymer)나 방부제 등의 원료로 사용하며 이르면 2025년 첫번째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츠쿠바(Tsukuba)대학 스타트업 BioPhenolics는 스마트셀을 활용한 방향족 화합물 양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BioPhenolics는 스마트셀 개발부터 양산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플래스틱 및 전자 소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카테콜(Catechol), 갈릭산(Galic Acid), PA 등 보유하고 있는 약 30종의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수요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양산기술을 확립하고 라이선스와 직접 생산, 생산위탁 등 투 트랙으로 사업화를 구상하고 있다.
2026-2027년경 수천톤급 파일럿 스케일 발효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사용 연구 확산
교토(Kyoto)대학 스타트업 Symbiobe는 탄소와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을 보유한 해양성 홍색 광합성 세균을 활용해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비료 및 수산사료 등을 생산하는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리관 내부를 순환하는 해수에서 배양하며 이산화탄소와 질소가스를 주입해 탄소·질소를 공급하고 다른 원소는 해수의 미네랄 성분으로 충당한다.
현재 양산기술을 개발하면서 이데미츠코산(Idemitsu Kosan)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대 비료 및 사료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견 및 생분해성 바이오 플래스틱 생산도 고려하고 있다.
도쿄(Tokyo)대학발 이산화탄소 자원화연구소(UCDI)는 이산화탄소를 주원료로 단백질 및 화학제품을 만드는 수소세균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24년 설비를 확장 이전하고 대체 단백질 원료 파일럿 생산기술 확립과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제품,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친환경 화학제품 합성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도 확대되고 있다.
AGC는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에틸렌을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전기분해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스타트업 Cert Systems와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Cert Systems는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 전기분해 기술을 활용한 에틸렌 파일럿 생산 실증에 성공한 바 있으며 양사는 상용화를 검토하고 있다. (윤)
<화학저널 2025년 08월 04·11일>
|






















 식 설비보다 소형이면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식 설비보다 소형이면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