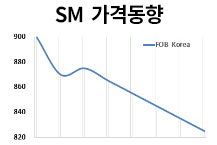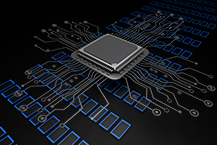국내 정유‧석유화학 대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투자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삼성과 SK가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으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으나 사실 바이오 영역은 바이오 CDMO(위탁 개발‧생산)나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제약에 그치지 않고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게 분포돼 있다.
2-3년 전 해양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상한 바이오 플래스틱이 그렇고, 석유 베이스 연료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바이오연료도 있으며, 바이오 농업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식품‧화장품도 빼놓을 수 없다.
굳이 ESG 경영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는 대세로 굳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바이오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 뻔해 석유 베이스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것은 지상과제 이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국내 화학기업들은 바이오제약이나 바이오 플래스틱에서 벗어나 바이오 제조로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바이오 제조 기술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해 2022년 2월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 제조는 제품·서비스 가치사슬의 구성요소를 변형시키기 위해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이다. 특히, 합성 생물학의 발전으로 DNA 합성, 시퀀싱 등 기초 생명공학 단위의 코스트 절감이 가능해지면서 바이오 제조 솔루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경 유망한 바이오 제조 응용 분야로 건강, 농업‧식품, 소비재, 화학제품‧소재, 지속가능성 5가지가 꼽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 분야는 신속한 팬데믹 대응을 뒷받침하는 핵산 백신 기술과 줄기세포를 활용한 장기 이식을, 농업‧식품 기술 분야는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는 저코스트 배양육 원료와 작물 마이크로바이옴(Crop Microbiome) 최적화를 꼽았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균총(Microbiome)을 활용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식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소비재 분야는 피부‧내장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를 통한 맞춤형 개인관리 및 영양 서비스를, 화학물질‧소재 분야는 플래스틱 및 동물성 소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바이오 폴리머를, 지속가능성 분야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오염된 폐수의 생물학적 환경 정화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부분 화학산업과 겹치고 있어 화학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바이오경제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10년 동안 급성장해 2030년경 4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새로운 성분·소재로 가치를 강화하고 석유 베이스 성분을 대체해 새로운 가치사슬을 생성할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생각된다.
폐수‧오염물질 처리(생물학적 정화), 온실가스 포집(생물학적 저장), 바이오 폴리머를 중심으로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생물학적 솔루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응한 의약품 생산 확대(생물보안) 등은 화학기업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분야이다.
다만, 기술이나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바이오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독 투자의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수적이고 ICT·제약과 공동으로 인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 유념해야 한다.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선택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이미 늦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